보리밭 사이로
 조까는
15
1310
13
2025.12.30 17:30
조까는
15
1310
13
2025.12.30 17:30
그날은 여름 초여름, 햇살이 피부를 찌르듯 뜨거운 오후였다.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대문이와 둘이서 지네 통을 들고 소나무 밭을 뒤지다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등짝에 땀이 흘러내리면 바람이 스치며 소름이 돋았고, 통 속에서 꿈틀대는 지네들을 보며 어린 가슴이 뛰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키 높은 보리밭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보리 이삭이 팔뚝을 간질이며 스치고, 흙냄새와 풋풋한 보리 향이 코를 간질였다.
갑자기 오른쪽 보리숲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습하고 달콤한 소리가 새어 나왔다.
“으응… 아아… 거기… 더 깊이… 제발…” 여자의 목소리는 숨이 넘어갈 듯 가빠 있었고, 끝마다 떨리는 애교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낮고 거친 숨소리. “하아… 씨발, 아직도 이렇게 좁아? 젠장… 미치겠네…” 쇳소리처럼 갈라진 목소리가 보리밭을 울렸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숨을 죽였다. 처음엔 무서웠다. 뱀인가, 귀신인가. 하지만 사람 소리라는 걸 알자 호기심이 이겼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보리 줄기를 살짝 벌렸다.
그 순간,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린 듯 숨이 멎었다.
동네 점방 아줌마였다. 평소엔 흰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 입고, 부드러운 미소로 “뭐 살 거야?” 하며 과자를 건네주던 그 아줌마.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치마는 허리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고, 흰 팬티는 한쪽 발목에 걸려 축 늘어져 있었다. 블라우스는 단추가 모두 풀려 가슴이 반쯤 드러났고, 땀에 젖은 가슴골이 햇살에 번들거렸다. 아줌마는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높이 들고 있었고, 낯선 아저씨가 뒤에서 허리를 단단히 잡은 채 세게 세게 찌르고 있었다.
짝… 짝… 짝… 살이 부딪히는 축축한 소리가 보리밭에 울려 퍼졌다. 아저씨의 굵고 핏줄 선 좆이 아줌마의 보지 안으로 드나들 때마다, 붉고 젖은 살이 뒤집히며 하얀 거품이 일었다. 아줌마는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며 목을 젖혔다. “아… 아아아…! 너무 좋아… 더… 더 세게…!” 신음이 새어 나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참지 못하고 터져 나왔다.
아저씨는 이를 악물고 숨을 몰아쉬며, “좆이… 녹아내릴 것 같아… 진짜… 아직도 이렇게 빨아들이네…”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려 더 깊이 찔렀다. 햇살이 보리 사이로 내려와, 땀에 젖은 아줌마의 허리와 엉덩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땀방울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려 엉덩이 골에 고였다가, 아저씨의 움직임에 따라 튀어 올랐다.
뜨거운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남녀의 체액이 섞인 짙고 비린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그게 정확히 뭔지 몰랐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열이 피어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은 도저히 뗄 수 없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아저씨가 갑자기 허리를 세게 누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 나와… 안에… 다 줄게…!” 아줌마는 엉덩이를 더 높이 들며 애원하듯 외쳤다. “줘… 안에… 다 줘… 뜨거운 거… 제발…!”
잠시 후, 아저씨가 천천히 몸을 뺐다. 아줌마의 보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안에서 하얗고 끈적한 정액이 주르륵 흘러내려 허벅지를 타고 내려왔다.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바지를 올리려던 순간, 대문이와 눈이 딱 마주쳤다.
“야… 이 새끼들… 뭐 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아줌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쫓아왔다. “아이구… 어떡해… 다 들켰어… 얘들아! 이리 와… 제발…!”
대문이는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나는 바보처럼 “네…” 하고 발이 멈췄다. 아저씨가 재빨리 달려와 내 뒷덜미를 세게 잡아끌었다. “이리 와, 새끼야. 가만있어.”
아줌마는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땀에 젖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볼에 붙어 있고, 입술은 아직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숨은 여전히 가빴다. “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줌마가… 아줌마가 잘못했어… 응? 제발… 우리 비밀 지켜줘…”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이 떨리며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무섭고 놀라서 울음이 터졌다. “네… 안… 안 할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줌마의 떨리는 엉덩이, 살 부딪히는 축축한 소리, 흘러내리던 하얀 액체, 그리고 그 짙은 냄새가 자꾸만 코와 귀와 눈앞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점방 앞.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고 애원하는 빛이 가득했다. “얘… 여기 좀 봐.” 아줌마는 몰래 뽀빠이 한 봉지와 아폴로 세 개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말… 안 했지?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 했어요.” 아줌마는 안심한 듯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착한 애야… 앞으로도 절대 비밀로 해주면… 아줌마가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줄게…”
그 뒤로 점방에 갈 때마다 아줌마와 눈이 마주치면,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줌마는 늘 과자를 하나 더 챙겨주었고, 가끔은 손을 살짝 잡아끌어 계산대 뒤로 데려가 “우리 비밀, 잘 지키고 있지?” 하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 뜨거운 숨결이 귀를 간질일 때마다, 그 보리밭의 냄새와 소리와 열기가 다시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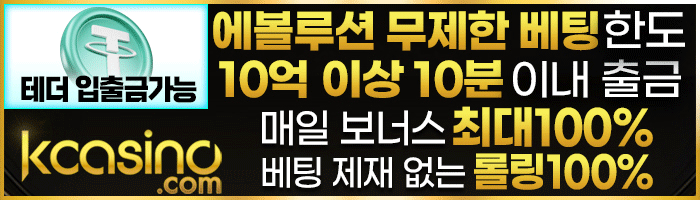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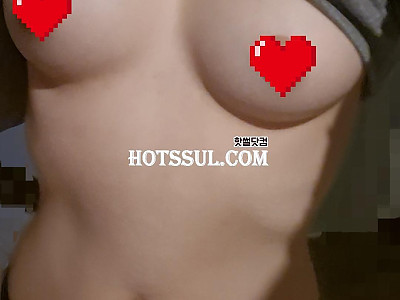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월드카지노
월드카지노 Blazing
Blazing 장난하나
장난하나 온고을
온고을 제천모자충
제천모자충 흐린기억
흐린기억
 스위치
스위치 가을향기2
가을향기2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RnadldlTsm
RnadldlTsm monggu
monggu 개구리2
개구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