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의 그날 밤
그날은 서울 한여름 밤이었다. 습하고 눅눅한 바람이 골목 사이를 기어 들어왔고, 사람들 몸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치킨 기름 냄새가 홍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회사 끝나고 친구랑 맥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까먹고 안 나왔다. 혼자 테이블에 앉아 폰만 만지작거리며 컵에 맥주를 홀짝이는데, 옆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다.
고개를 돌리니 긴 생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린 여자가 있었다. 땀에 젖은 흰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속살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주변의 튀김 냄새와는 전혀 다른, 묘하게 중독적인 향이었다. 순간 눈이 마주쳤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혼자예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입김에 맥주와 치킨 향이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 달콤하게 느껴졌다.
“네. 친구가 안 왔네요.”
내 대답에 그녀가 웃으며 의자를 옮겨왔다.
이름은 은영. 대화는 가볍게 시작됐지만, 그녀는 갑자기 나를 빤히 보며 물었다.
“너, 모험 좋아해?”
“모험이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럼 오늘 밤 색다른 거 해볼래?”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와 묘한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땀에 젖은 목덜미가 네온사인 불빛에 반짝였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밀려왔다.
“뭐… 뭔데요?” 내가 묻자,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친구 집이 비어 있는데 잠깐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서.”
농담 같으면서도 진지했다. 순간 이상하게 끌렸고,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다.
“좋아요. 같이 가보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손바닥은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그게 오히려 신경을 자극했다.
택시에 올라탔을 때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창문 틈으로 더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은영은 내 무릎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그냥 재밌자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그녀의 숨결이 섞여 귀를 간질였다. 심장은 쿵쿵 뛰었고, 허벅지 위에 얹힌 그녀의 손바닥이 점점 뜨겁게 달궈졌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여기서부터 진짜야.”
현관문이 열리자 집 안은 적막했다. 공기청정기 향이 났지만 그 밑으로 눅눅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와… 진짜 아무도 없네요.”
내 말에 은영이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지.”
그녀는 갑자기 다가와 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당황하자 그녀가 웃으며 속삭였다.
“너무 긴장했잖아. 좀 풀어져야지.”
손끝이 피부를 스치며 체온이 전해졌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앉자마자 애무가 시작됐다. 은영의 손바닥은 땀에 젖어 미끄러웠고, 손톱이 가슴을 긁을 때마다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다. 나는 그녀의 탱크톱을 끌어올렸고, 젖은 피부가 드러났다. 내 손이 가슴을 움켜쥐자 그녀가 신음을 흘렸다.
“으응… 더 세게.”
스커트 아래로 손을 밀어 넣으니 뜨거운 열기와 짙은 냄새가 올라왔다. 팬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자 그녀가 몸을 움찔하며 신음을 삼켰다.
“아… 거기…! 좋아…”
“여기서 괜찮아?” 내가 묻자 그녀는 허리를 당겨 붙이며 말했다.
“걱정 마. 아무도 안 와.”
그 말이 방아쇠가 됐다.
삽입 순간, 뜨겁고 축축한 감촉이 나를 감싸며 젖은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하아…! 깊어…!” 그녀의 신음이 공기 중에 진동했다.
허리를 잡고 밀어붙일 때마다 젖은 소리가 끈적하게 퍼졌고, 그녀의 질은 나를 조이며 안쪽까지 빨아들였다. 은영은 허리를 들썩이며 더 깊게 원했다. 나는 손끝으로 음핵을 강하게 문질렀고, 그녀의 몸이 굳어지며 첫 절정이 밀려왔다.
“하아악…! 아앙…!”
질이 수축하며 나를 꽉 죄었고, 그녀의 다리는 떨리며 바닥에 손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리듬을 미친 듯이 빠르게 바꾸자 그녀는 울부짖듯 신음을 터뜨렸다.
“으으아아…! 세게… 더…!”
그 순간 나도 끝까지 몰아붙였다. 뜨겁게 터져 나오는 정액이 그녀 안으로 쏟아졌고, 질벽은 마지막 수축으로 나를 꽉 조였다. 방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와 젖은 소리만 가득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뭐야, 이게?!” 친구였다.
은영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 분위기 좀 탔네.”
친구는 황당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고, 우리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었다.
그날 이후 은영을 다시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땀 냄새, 달아오른 숨소리, 그리고 바닥에 번져 있던 끈적한 체취는 아직도 내 기억에 선명하다.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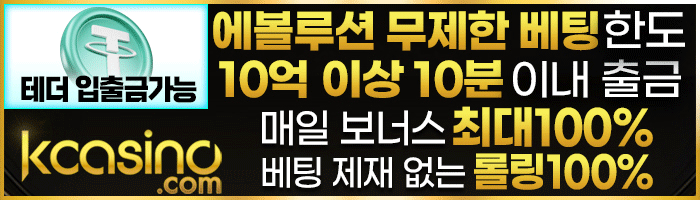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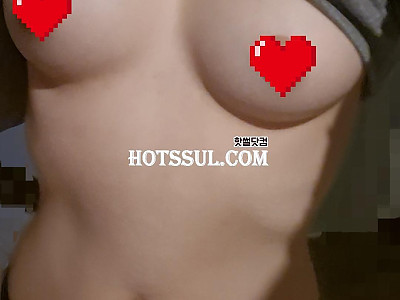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AVEN CASINO
AVEN CASINO 비틀자
비틀자 온고을
온고을 친친로
친친로 KEKEKE
KEKEKE 테웨이
테웨이 카레엔시금치
카레엔시금치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어획량이
어획량이 아네타
아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