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대문이와 엄마, 여동생
 조까는
63
3373
27
2025.12.05 15:54
조까는
63
3373
27
2025.12.05 15:54
1995년 가을 내 친구 대문이가 지 엄마랑 동반 자살을 했다. 난 그 이유를 안다. 대문이랑 나는 어릴적 부랄친구였다.
그 아빠는 대문이가 4살..5살 정도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때가 내가 중학교 때였다.
어느날 학교를 갔는데 대문이가 결석을 한거였다.
어제만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학교가 끝나고 난 집으로 돌아가면서 대문이네 집엘 들렸다.
앞에 유리창문을 열고 대문아 하고 부르니 대답은 없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신발을 벗고 안방 문을 열었다
헉… 진짜 충격. 대문이가 알몸으로 엄마 등 뒤에 딱 붙어서 허리를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음. 대문이 엄마는 30대 후반쯤 됐을 텐데, 피부가 하얗고 가슴이 크고 허리가 잘록한 그 몸매가… 침대 시트에 네 발로 엎드려서 고개 푹 숙인 채로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음. “아… 대문아… 더 세게… 엄마가… 아흥…” 이런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림. 대문이 물건이 엄마 ×××에 박히고 빠지는 게 똑똑히 보였음. 젖은 소리가 쩍쩍 나고, 대문이 손이 엄마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는데 젖꼭지가 빨갛게 부풀어 있었음. 그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었음. 대문이가 “엄마… ××× 꽉 조여… 나 올 것 같아…” 하면서 더 빨리 찌르는데, 엄마가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받아치고 있었음. 방 안엔 땀 냄새랑 그 끈적한 냄새가 진동했음. 침대 머리맡에 대문이 아빠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모자지간이 그렇게 섞여 있는 게… 진짜 머릿속이 하얘짐.
나는 문 틈으로 얼어붙어서 보고 있는데, 대문이가 갑자기 고개 돌려서 나랑 눈 마주침. 그 눈빛이… 공포와 흥분이 섞인 그런 눈이었음. “야… 너…!” 하면서 대문이가 멈추려 하니까, 엄마가 “왜 그래? 계속 해… 엄마가 미칠 것 같아…” 하면서 엉덩이를 흔들어대. 대문이가 그냥 무시하고 계속 찌르는데, 결국 “엄마… 나…!” 하면서 안에다 풀어버림. 엄마 ×××에서 하얀 게 흘러내리는 게 보였음. 둘이 헐떡이면서 침대에 쓰러지는데, 엄마가 대문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좋았어… 우리 대문이… 엄마만의 남자…” 이런 소리를 중얼거림.
그날 이후로 대문이랑 나는 말 한마디 안 했음. 학교에서 마주쳐도 서로 피하고… 하지만 그날 본 게 머릿속에 박혀서 밤에 잠도 못 잤음. 대문이 아빠 돌아가신 게 대문이 4~5살 때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대문이를 그렇게 키웠을 거임. 엄마 혼자서 과부 생활 하다 보니… 대문이를 남자로 본 거지. 대문이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을 텐데, 내가 목격한 게 트리거 돼서 죄책감 폭발한 거임.
1995년 11월 하늘이 회색빛이고 안개가 자욱했던 그날.
대문이네 뒷마당 측백나무 아래로 다가갔을 때
바람 한 점 없어서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음.
두 사람이 나란히, 아주 조용히 매달려 있었음.
대문이 엄마는 평소 입던 그 연두색 티셔츠에 펑퍼짐한 베이지색 일바지 차림 그대로였고, 대문이는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 입은 채였음. 신발은 둘 다 벗어서 가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음. 엄마는 흰 양말, 대문이는 검정 양말.
밧줄은 그냥 집에 굴러다니던 노란 나일론 로프 두 가닥이었고 목에 한 바퀴씩 감긴 게 전부였음.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눈은 반쯤 떠져 있었지만 표정은 놀랄 정도로 평온했음.
그냥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나란히 떠 있었음. 발끝이 땅에서 30cm 정도 떠 있었고 몸이 아주 천천히, 왼쪽→오른쪽→왼쪽으로만 살짝씩 흔들릴 뿐이었음.
유언장도, 쪽지도, 아무것도 없었음. 주머니를 다 뒤져도 빈 종이 한 장 나오지 않았대.
다만 엄마 일바지 허리춤에 대문이가 어릴 때 줬던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아직도 달려 있었음. 그 열쇠고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면서 딸랑… 딸랑… 하는 소리만 계속 났음.
경찰이 와서 내릴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음. 그 열쇠고리 소리만 계속 귀에 박혔음.
지금도 가끔 그 연두색 티셔츠랑 펑퍼짐한 일바지, 그리고 노란 밧줄이 떠오르면 가슴이 꽉 막힘.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떠난 게 제일 무서웠음.
그리고 한 15년 쯤 후
2010년 겨울, 강남역 뒷골목 단란주점 ‘루비’.
밤 12시쯤, 친구들이랑 2차로 들어갔는데 마담이 “오늘 신입 예쁜 애 들어왔어요~” 하면서 은영이를 데리고 나왔음.
처음엔 몰랐음. 짧은 검은 원피스에 허벅지 스타킹, 화장 진하게 하고 머리도 염색해서 그런지 전혀 어린 시절 모습이 안 보였음. 근데 목소리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했음. “오빠들~ 뭐 마실래요?” 그 익숙한 강원도 억양, 그 말투… 분명 대문이 여동생 은영이였음.
당시 은영이 나이 27살쯤. 작은 이모한테 맡겨져서 강원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출해서 서울 올라왔다고 하더라. 테이블에 앉자마자 은영이가 내 옆에 딱 붙어서 “오빠… 나 아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서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봄.
나는 당황해서 “아니… 사람 잘못 본 거 아냐?” 했는데 은영이가 피식 웃더니 “오빠… 나 알아. 대문이 오빠 친구였잖아. 그때 우리 집 뒷마당 측백나무… 기억나?” 그 말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음.
술 한 잔 따라주면서 은영이가 속삭임. “오빠… 나 그날 이후로 아무도 못 믿었어. 오빠만 빼고.” 그러더니 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오늘은… 나 좀 데려가줄 수 있어?”
결국 룸으로 들어갔음. 불 꺼지고 음악만 나오는데 은영이가 원피스 지퍼를 내리면서 “오빠… 나 그때부터 오빠 생각만 했어. 엄마랑 오빠가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나도 언젠가 오빠한테 그렇게 되고 싶었어.” 그러면서 내 바지 지퍼를 내리고 무릎 꿇고 입으로 해주는데 그 눈빛이… 진짜 슬프면서도 미친 듯이 원하고 있었음.
그날 이후로 은영이는 그 단란주점 그만두고 내가 사는 오피스텔로 들어왔음. 밤마다 침대에서 “오빠… 나도 엄마처럼… 나만의 남자 갖고 싶었어…” 하면서 울면서 안겼음.
지금도 은영이랑 같이 살고 있음. 가끔 뒷마당 측백나무 얘기 나오면 둘이 말없이 꼭 안고 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은영이가 내 가슴에 얼굴 묻고 “오빠… 나 이제야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함.
그 측백나무 아래서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15년 만에 다시 내 품에 돌아온 기분. 가끔 은영이 자는 모습 보면 대문이 엄마 젊은 시절이 겹쳐 보일 때가 있음. 진짜… 운명이란 게 무섭다. ㅠ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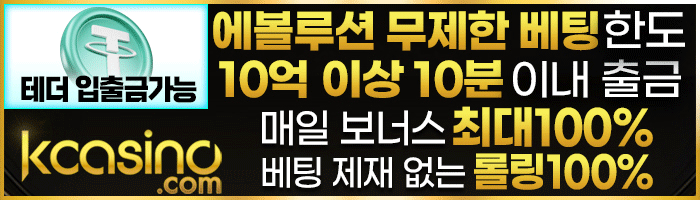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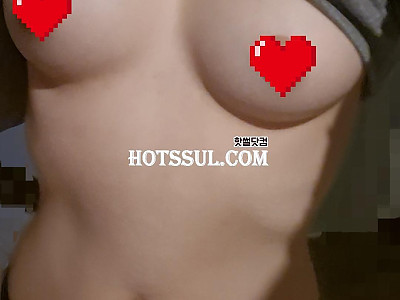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URUS
URUS 나이젤
나이젤
 비나무
비나무 면세유
면세유 도라짱
도라짱 해누
해누
 찬돌이
찬돌이 sassd
sassd 아이브
아이브 온고을
온고을 테웨이
테웨이 가을향기2
가을향기2 김수한무거북이와
김수한무거북이와 마리머시모
마리머시모 안톨구
안톨구 몽키D루피
몽키D루피 마임이
마임이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어흥이
어흥이 노바
노바 썰풀이
썰풀이
 꾼이야꾼
꾼이야꾼 보연이
보연이 빨간고추
빨간고추 아네타
아네타 머슬머슬맨
머슬머슬맨 kims30
kims30
 홍홍홍
홍홍홍 늑대의하루
늑대의하루 리얼라이프
리얼라이프 이고니스존
이고니스존 핫뜨
핫뜨 가수진
가수진 바리바림
바리바림 머라카는교
머라카는교
 은낭
은낭 uuu4u
uuu4u Dhdjjejsjsjsdjd…
Dhdjjejsjsjsdj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