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인생 12
 조까는
8
909
10
2025.12.16 17:08
조까는
8
909
10
2025.12.16 17:08
첫 현장이 염창동 ○○아파트였다. 1970년대 초에 지어진 5층짜리 낡은 단지. 처음 현장 들어갈 때 솔직히 등골이 오싹했다. 복도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외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서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다. 누수 흔적은 사방에, 발코니 아래로 내려다보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녹슨 철근이 덕지덕지 드러나 있었다. 계단 난간은 흔들리고, 엘리베이터는 아예 고장 나서 걸어 올라야 했다.
현장 조사 끝나고 보고서 올리니 결과는 ‘재건축 필요’. 그해에만 비슷한 단지 5~6곳을 돌았다. 하나같이 70~8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 구조 계산 다시 하고, 균열 사진 찍고, 콘크리트 코어 시험하고… 매번 같은 결론이었다. 안전 등급 D 이하, 재건축 불가피.
그때부터 내 인생에 암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재건축 판정위원회 실무팀에 들어가면서 알았다. 이 위원회라는 게 단순한 ‘안전 진단’이 아니라는 걸. 재건축 소견이 올라오면 현장에 나가 최종 가·부를 결정하는 곳. 그 권한이 막대했다. 한 아파트의 운명이 내 손끝 하나에 달려 있었다. 평가 기간은 길면 한 달, 짧으면 보름. 그 기간 동안 위원회 직원들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까지 나를 ‘하나님’처럼 모셨다.
반포동 ○○아파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고급 단지라더니, 부녀회장부터 동대표, 관리소장까지 줄줄이 나를 챙겼다. 현장 조사 끝나고 저녁이면 “위원님, 피곤하시죠?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술자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룸살롱, 아니면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이어졌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모님들이었다. 평소엔 품위 있고 우아한 척하던 분들이, 문만 닫히면 옷을 벗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나를 가운데 앉히고 번갈아 가며 몸을 비비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그날 밤은 정말 정신을 잃을 만큼 격렬했다. 술 취한 사모님들이 서로 경쟁하듯 내 좆물을 받아내려고 여념이 없었다. 누군가는 입으로, 누군가는 가슴으로, 누군가는 아래로…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검은 봉투. 1천에서 5천, 현금으로 꽉 차 있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맞나?’ 싶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될수록 그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다. 오히려 그 권력의 맛, 그 쾌감이 중독됐다.
나는 안전 진단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아파트의 운명을 바꾸고, 그 대가로 돈과 여자를 받았다.
그림자는 그렇게 점점 짙어졌다. 그리고 그 암흑은, 나를 완전히 삼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현장 나가서 아파트 외벽 균열 사진 찍고 콘크리트 코어 시료 채취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공무원 한 명이 나타났다. 양복 입고 목에 신분증 걸고, 거들먹거리며 현장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그때 그 새끼가 부하 직원한테 툭 던진 말이 내 귀에 딱 꽂혔다.
“판정위원회 새끼들 아무 힘도 없어… 좃나게 무게만 잡고… 지랄 떨어봤자 밥맛 떨어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그동안 밤낮없이 현장 뛰고 보고서 쓰고, 그 권한으로 아파트 운명 결정짓는 게 ‘무게만 잡는 지랄’이라고? 화가 치밀었지만, 그 자리에서 공무원하고 싸울 수는 없었다. 그냥 이를 악물고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다. ‘너희들 다 누를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때 내 나이 28살. 바로 야간 대학원 원서 넣고 입학했다. 낮에는 연구원 일하고, 밤에는 강의실로 달려갔다. 주말도 없이 논문 읽고, 실험하고, 시험 치고… 다시 “하나에 미치면 다른 건 안 보는” 성격이 발휘됐다.
석사 졸업하자마자 바로 박사 과정. 그리고 건축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까지 연달아 땄다. 시험 칠 때마다 “좃나게 쉬운데… 뭐 이런 거 가지고 5~6년 공부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미 현장 경험과 연구원이 쌓아놓은 실무가 뒷받침돼서, 이론은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동경대학 건축공학과. 국비 유학으로 3년간 머물렀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
하숙집 주인 아줌마. 40대 중반, 남편은 지방 발령 나고 혼자 살던 분. 저녁에 사케 한 잔 주시면서 시작된 관계였다. 그녀는 내게 일본 가정식을 해주고, 나는 그녀에게 밤마다 뜨거운 위로를 주었다.
하숙집 딸내미. 대학생, 20대 초반. 엄마 몰래 내 방으로 들어와서 “오빠, 일본어 가르쳐줘” 하면서 시작됐다. 그녀는 내게 젊음의 맛을, 나는 그녀에게 처음 경험을 선물했다.
동경대 건축학과 여조교. 30대 초반, 지적이고 섹시한 안경 낀 선배 연구원. 연구실에서 논문 토론하다가 자연스럽게 호텔로… 그녀는 내게 학문적 자극을, 나는 그녀에게 육체적 쾌감을 주었다.
신칸센 매표소 아가씨. 역에서 매일 마주치던 20대 후반 여직원. 어느 날 늦은 막차 타고 돌아오다 우연히 같은 칸에 타서 대화가 시작됐다. 그녀는 내게 일본 철도의 모든 노선을, 나는 그녀에게 한국 남자의 열정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 벌러 온 아가씨들. 이케부쿠로, 롯폰기, 신주쿠의 한국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 그들은 나를 ‘유학생 오빠’라고 부르며 안겼고, 나는 그들에게 넉넉한 팁과 뜨거운 밤을 선사했다.
3년간, 정말 많이도 했다. 공부도, 연구도, 그리고 사랑도… 아니, 욕망도.
그때 나는 알았다. 권력은 자격증이나 학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그 서울시청 공무원의 말을 웃으며 떠올릴 수 있게 됐다.
“아무 힘도 없다더니… 이제 누가 더 무게 잡는지 보자.”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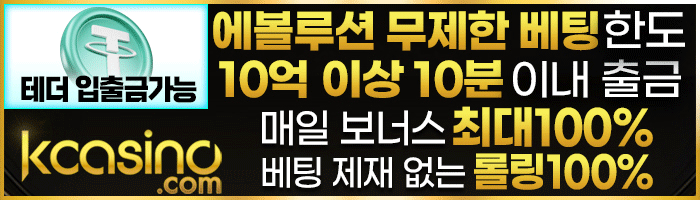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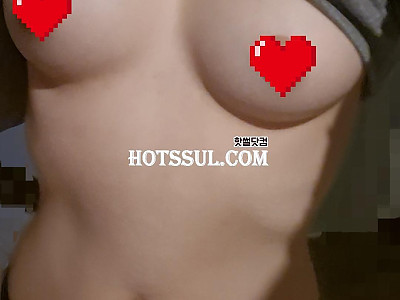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윤지
윤지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테웨이
테웨이 아네타
아네타 스위치
스위치 다이아몬드12
다이아몬드12 이고니스존
이고니스존 koongdi
koong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