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부부들 - 제 36화
 처형Mandy봊이속살
4
538
0
2025.12.18 08:08
처형Mandy봊이속살
4
538
0
2025.12.18 08:08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그날 밤이었다. 더 이상 감으로, 눈치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이 더 이상 기분 탓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정시 퇴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팀장은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며칠 동안, 오후 다섯 시가 되면 자리를 정리해 회사 문을 나섰다.
수잔나가 일하는 어학원 근처 카페는 퇴근 시간쯤에도 생각보다 조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시간을 흘려보냈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어학원의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어학원을 나오고, 수잔나는 그 사이에 섞여 함께 걸어 나온다. 그러나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아무 일 없었다.
‘.......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런 생각이 들 즈음,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오후 6시 15분. 어학원 문이 열리고 수잔나가 나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 다름없는 걸음걸이. 그런데 길가에 서 있는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차였다. 주혁이 타고 다니는 것. 수잔나는 망설임없이 그쪽으로 걸어갔고, 조수석 문을 열더니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조용히 차를 몰아 뒤를 밟았다. 두 사람은 30여분 정도 운전해서 한 닭갈비집에 들어갔다. 주차장에 들어가, 차를 최대한 출입구 가까이에 대고서는 식당 안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고기를 먹고, 수잔나는 혼자서 술을 한 잔 하고, 서로의 입에 고기를 넣어주고 난리도 아니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들은 차를 두고서는 어디론가 걸어간다. 조용히 뒤를 밟으니 모텔 간판이 보였다.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둘은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 광경을 보면서도 화는 나지 않았다. 그냥...... 허탈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노력들 — 말을 아끼고, 배려하려 애쓰고, 더 잘해보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 —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느낌. 그래서였을까? 분노 대신 담담함이 먼저 찾아왔다. 나 역시 떳떳하지 못했으니까. 그제야 분명해졌다. 우리 넷 중에, 선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걸. 그리고, 이 결혼 생활도 이미 끝났다는 사실도. 다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소주를 세 병이나 비웠다. 취기가 오르자, 참아왔던 이름 하나가 입술을 비집고 나왔다.
[엘리나]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두 번 정도 가다가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에 대한 첫 마디는 ‘보고 싶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도 같은 말을 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을 짓누르던 중압감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제야 인정했다. 말로는 부정해왔지만, 나는 이미 엘리나에게 마음을 전부 주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퇴근 후 돌아온 집은 여전히 냉랭했다. 수잔나와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각자의 공간에 머무르며 시간을 보냈다. 음악을 들으면서 거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면서 엘리나의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경률아, 으흐흑, 흑흑.......”
울음이 섞인 목소리에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나는 들고 있던 덤벨을 내려놓았다.
“왜 그래?”
“나....... 쫓겨났어.”
맙소사, 엘리나는 주혁과 또 한 번 크게 다퉜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주혁이 새끼가 엘리나의 옷가지들과 짐을 캐리어에 모두 넣고는 문밖으로 던졌다고. 그 새끼에게 쌓였던 감정이 이윽고 폭발했고, 전화기를 쥔 내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 때, TV를 보던 수잔나가 내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질문에 나는 숨을 고르고 사실대로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잔나는 말했다.
“당장 가자. 엘리나 혼자 둘 수 없잖아.”
그러면서 겉옷을 집어 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와....... 어쩜 저렇게 가식적일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 감정보다 엘리나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나는 말없이 차 키를 집어 들었고, 수잔나를 태운 채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차를 세우자마자 처음 보이는 것은 엘리나의 실루엣이었다. 빌라 입구 앞,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그녀는 캐리어 가방을 옆에 둔 채 쭈그려 앉아 있었다. 어깨를 잔뜩 웅크린 모습이, 마치 버려진 사람 같았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이성이 끊어졌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엘리나가 우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대로 일어나 이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옆에 수잔나가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엘리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등을 두드리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엘리나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뒤로 보내고, 빌라 쪽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손바닥으로, 그다음엔 주먹으로.
쾅, 쾅.
아무 반응이 없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더는 누를 수 없었다.
“심주혁, 문 열어 이 새끼야!”
목소리가 계단을 울렸다. 그 순간의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엘리나의 울음, 수잔나의 침묵,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철컥— 문이 열리고 주혁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씹새끼가.”
그 한마디와 함께 주먹이 먼저 나갔다. 주혁은 ‘억-’하고 비명을 지르며 현관 바닥으로 쓰러졌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나는 멱살을 다시 움켜쥐고 반쯤 끌어올려 주먹을 몇 번이고 더 꽂았다.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고, 그의 입술 위로는 붉은 피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러는 찰나에 내 머릿속에서는 쾌감이 분노를 잠식해나갔다.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그만해!”
수잔나였다.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힘이 셌다. 아니, 어쩌면 내가 잠깐 멈췄는지도 모른다. 숨이 거칠어졌다. 내 시야가 흔들리는 사이, 수잔나는 나를 밀쳐내듯 떼어놓고는 주혁에게로 갔다.
“괜찮아? 정신 차려 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혁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방금 전까지 내 주먹이 오갔던 얼굴이었다.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쓰다듬고,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줬다. 그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그 순간, 무언가 안에서 뚝 하고 끊어지며, 내 주먹에는 힘이 쫙 풀렸다.
아, 그렇구나........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구나.
엘리나는 계속 내 옆에 서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 캐리어는 여전히 문 앞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 힘조차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한 번 봤다가, 다시 수잔나와 주혁을 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순간은....... 우리 부부들의 관계가 정말 끝났음을 알리는 선고라는 것을.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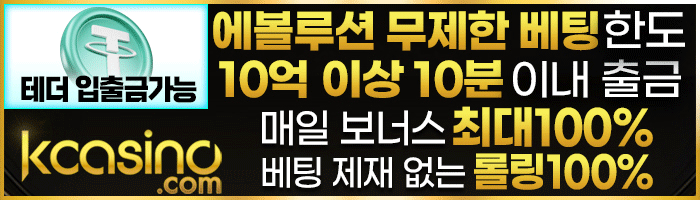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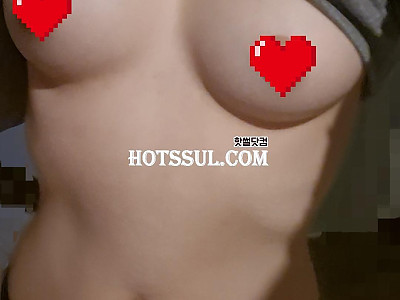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윤지
윤지 바가지
바가지 아네타
아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