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부부들 - 제 38화
 처형Mandy봊이속살
4
913
0
2025.12.19 09:39
처형Mandy봊이속살
4
913
0
2025.12.19 09:39
다음 날 아침,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다. 아주 짧고 건조하게.
[나 - 할 말 있어. 전부 7시까지 당촌역 앞 카페로 와]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이 만남이 끝이라는 걸.
퇴근 후, 엘리나를 차에 태우고서 약속한 곳으로 갔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유난히 차갑다. 주혁과 수잔나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서로를 마주 보는 게 아니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까이 앉은 둘의 모습이 어젯밤의 분노를 다시 일으켰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한번 얼어붙으면 절대 다시 녹지 않을 것 같은 냉기였다. 인사도 없이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컵에 담긴 물조차 마시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모이라고 했어.”
나는 주혁을 바라봤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너....... 정말 수잔나 사랑하냐?”
“네.”
단호한 대답. 숨을 들이쉴 틈조차 주지 않는다.
이번엔 수잔나다.
“너도....... 주혁이 사랑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응.”
그 한 음절로, 머릿속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무너졌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내가 버텨온 시간들, 수잔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위해 발버둥 쳤던 노력들에게 참 잔인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절망감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고, 짙은 남색 타일 바닥만 보였다. 그때, 옆에서 엘리나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따뜻한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쥐자, 추락하는 것만 같던 나 자신이 구원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수잔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은 분명했다.
“이제 당신한테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연극하고 싶지 않아. 주혁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나가 벌떡 일어났다.
“미친년 아니야?”
카페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나는 급히 엘리나의 손목을 잡았다.
“그만해.”
그녀의 숨소리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거칠어졌다.
“경률아, 얘 지금 뭐라는지 못 들었어?”
“됐어. 그렇게 하라고 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끝나버린 느낌이 들었다.
“길게 얘기해봐야 소용 없겠네. 우리 넷 다 모두 확실하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수잔나를 봤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와서 당신 짐 다 챙겨서 나가.”
엘리나의 손을 잡고 함께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녀가 몸을 홱 돌리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들더니, 그대로 주혁의 얼굴에 끼얹었다.
“개새끼야!”
물방울이 주혁의 얼굴과 셔츠를 타고 흘러내렸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졌다. 엘리나는 멈추지 않았고, 그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겼다.
“네가 인간이냐? 진짜?”
그리고는 수잔나에게 달려들었다. 머리채를 움켜쥐며 소리치자 수잔나도 엘리나의 머리를 잡으면서 영어로 욕을 내뱉기 시작했다. 여자 둘이 엉켜 넘어졌고, 카페 직원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뜯어말렸다. 의자들이 밀리고, 테이블 위의 물컵이 엎어져 물이 쏟아져 내린다. 주혁은 두 여자를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지만 나는 멀찌감치 지켜만 볼 뿐,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뭐랄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인데도, 전혀 현실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말린 덕분에 엘리나와 수잔나는 겨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엘리나는 수잔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고, 수잔나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독기서린 눈으로 엘리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제야, 굳어 있던 내 몸이 풀렸고, 나는 엘리나의 팔짱을 끼고서 카페를 나왔다.
우리 둘은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 엘리나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 보였다. 눈만 붉힌 채 가방을 닫았다. 택시를 타고 내 집으로 가니,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수잔나와 주혁이 이미 와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캐리어 두 개가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짐을 챙겼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말도 없었다. 지퍼 닫히는 소리가 나고 두 사람은 우리 곁을 지나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 버렸다.
----------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엘리나와 나는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내 머릿속은 아직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매몰차게 떠나갔던 주혁과 수잔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하는 되도 않은 생각까지 해 본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뜬다. 주혁이 보낸 것이었다. 우리 둘은 동시에 폰을 열어 읽었다.
[주혁 - @엘리나 당신 남은 짐 현관 밖에 다 내놨으니까 와서 가져 가]
그 뒤로 ‘심주혁님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수잔나님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라는 알림이 차례로 뜨며 그 곳에는 엘리나와 우리 둘만 남게 되었다. 멍하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나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두 연놈들 쌍판때기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엘리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빛은 단단했고, 행동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서 주혁의 집으로 갔고, 그 현관 앞에는 그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짐들이 놓여 있었다. 엘리나와 나는 그것을 하나씩 주워서 트렁크에 실었다.
수잔나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나 싶다가도, 여전히 실감 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늦게 도착하는 타입처럼, 현실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생각들은 내 안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엉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이사이로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다. 앞으로 엘리나와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였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빌리지 않아도 되는 관계. 당당하게 그녀를 안고,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숨이 조금 트였다.
수잔나의 물건들로 채워졌던 서랍장, 옷장은 엘리나의 것으로 하나둘씩 채워졌다. 그럼에도 수잔나와 내가 함께한 세월들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함께 쓰던 머그컵, 우리 두 사람의 칫솔이 나란히 걸려 있던 칫솔걸이, 욕실 용품, 같이 장 봐왔던 식자재들. 그리고....... 거실 벽 한쪽에 아직까지 걸려 있는 결혼사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남녀. 쟤들은 쟤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걸 알았을까?
그 사진 앞에 멈춰서 멍하니 있는데, 엘리나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알기라도 했을까? 그녀는 나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사실 난 이런 순간을....... 오래 기다렸어.”
그녀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집에 남은 흔적들, 하나씩 우리 행복으로 바꿔가자.”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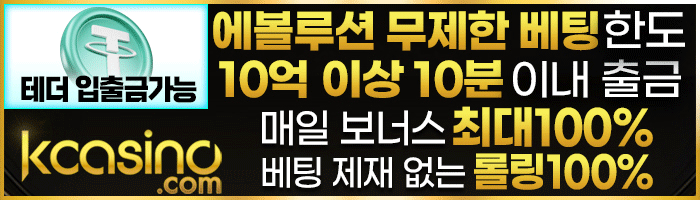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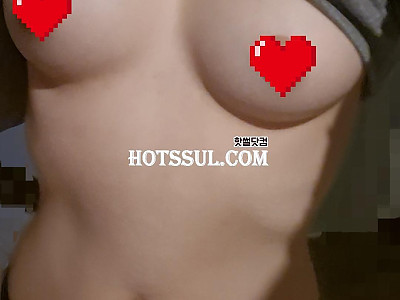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OECD
OECD 바가지
바가지 아네타
아네타 gcutuytoc
gcutuyt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