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첫경험(?)
 bluesand
46
2978
19
2025.12.03 04:57
bluesand
46
2978
19
2025.12.03 04:57
여친이 예전에 제게 간간히 들려주던 그녀의 첫경험 이야기를 종합해서,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답니다.
지영(여친의 가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빠 지인 소개로 은행 계약직에 들어갔다. 스무 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나이였다.
첫날부터 김 과장이 눈에 밟혔다. 40대 중반, 딸 둘에 결혼반지 반짝이는 유부남. 그런데 지영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야 지영 씨, 이거 해외송금 BIC 코드잖아. 내가 지난주에 세 번은 말해줬는데 또 틀리네?”
“죄송합니다… 다시 알려주세요.”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정직원 되고 싶으면 정신 차려야지. 내가 특별히 챙겨주는 거야.”
실은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준 적 없었다. 일부러 복잡하게 말해놓고는 지영이 헷갈리면 “머리 나쁘네?” 하며 비웃었다. 그러고는 자기 대출 심사 서류를 슬쩍 떠넘겼다. 퇴근은 늘 과장 마음대로.
“오늘도 좀 남아서 정리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정직원 만들어줄게.”
처음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다. 나중엔 협박처럼 들렸다.
회식 때마다 지옥이었다. 술을 강제로 들이붓고, 2차는 무조건 노래방. “블루스 한 곡만” 하더니 어두운 방에서 몸을 밀착시켰다. 땀 냄새 나는 셔츠가 얼굴에 닿았다. 허리를 감싼 손이 점점 내려가 엉덩이를 꽉 쥐었다. 가슴을 스치며 귀에 속삭였다.
“너 진짜 예쁘다… 내가 얼마나 널 좋아하는데…”
지영은 몸을 굳혔다. 그래도 “정직원 시켜줄게”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여기서 멈추면 부모님들이 실망할까봐 끝까지 버텼다.
그날도 똑같았다. 폭탄주를 연거푸 들이키고, 눈앞이 핑 돌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결국 둘이 남았다.
“지영아, 너 취했네. 내가 데려다줄게.”
의식이 끊겼다.
정신을 차보니 모텔 침대였다.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리고 있었다.
“과장님… 싫어요…”
“쉿, 조용히 해. 내가 얼마나 너 좋아하는데.”
브래지어가 벗겨졌다. 처음으로 남자 앞에 가슴을 드러냈다. 과장은 침을 삼키며 젖꼭지를 빨아댔다. 혀끝이 핥아대는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역겹다는 생각과 동시에 허리가 저절로 들썩였다. 지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아래가 축축해졌다.
과장은 바지를 내렸다. 팬티도 벗었다. 딱딱해진 성기를 꺼냈다. 작고 왼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지영은 겁이 났다. 저걸 넣는다고?
과장은 지영의 팬티를 옆으로 밀었다. 손가락 두 개를 넣더니 클리토리스를 거칠게 문질렀다. 지영은 숨이 막혔다.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쾌감. 신음이 터질 뻔했다. 이를 꽉 물었다.
“이제 넣는다.”
성기를 입구에 대고 밀어붙였다. 몇 번 찔렀다. 살짝 찢어지는 통증. 그런데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다. 휘어진 성기가 계속 옆으로 미끄러졌다. 지영은 아픔과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이 몰려왔다.
‘차라리… 빨리 박고 끝내면… 그 다음부턴 일할때, 괴롭히지 않겠지…’
그런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과장은 갑자기 허리를 떨더니, 끈적하고 뜨거운 정액을 지영의 배와 보지 위에 쏟아냈다. 비린내가 확 퍼졌다. 그리고 그대로 고개를 떨구며 코를 골았다.
지영은 멍하니 천장을 봤다. 술이 싹 깼다. 샤워실에서 정액을 닦아냈다. 팬티를 입어보니 아주 약간의 핏자국. 완전히 찢어졌는지, 살짝 손상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끝까지 들어오진 않았다.
조용히 옷을 입고 모텔을 나왔다. 새벽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다. 그래도 끝내 울지 않았다.
다음 날, 과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했다.
“야 지영, 대출 서류 또 틀렸네? 너 진짜…”
똑같은 핀잔, 똑같은 손길, 똑같은 “정직원 시켜줄게”.
지영은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대로 따먹히고 끝낼 걸’ 하는 후회마저 들었다가, 스스로를 욕했다.
3개월 뒤,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대학 준비하려고요.”
과장은 아쉬운 척했다.
“아깝다… 너 진짜 잘했는데…”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로 은행을 나왔다.
그 후로 한참 동안 누가 뒤에서 다가오면 몸이 굳었다. 엉덩이를 스치는 손길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그러던 어느 밤, 혼자 방에 누워 있었다. 문득 그날의 감각이 떠올랐다. 역겹던 손길, 아프면서도 짜릿했던 그 느낌.
지영은 천천히 손을 내려 팬티 안으로 넣었다. 처음으로 스스로 클리토리스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살짝 넣어본 손가락 끝에 그날의 통증이 되살아났다. 아프고, 뜨겁고, 허전했다. 손가락을 조금 더 깊이 넣었다가 뺐다. 숨이 가빠졌다.
그 새끼가 떠올랐다. 증오스러우면서도, 그 손길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다. 몸이 떨렸다. 지영은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더 빠르게 움직였다. 처음으로 스스로 절정에 올랐다.
그날 이후, 지영은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는 듯, 또 그날의 쾌감을 다시 느끼려는 듯, 밤이오면 자주 손가락을 자신에게 박았다. 그리고, 오늘 내 품에 안겨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놨다.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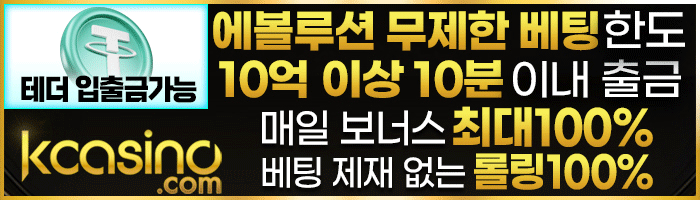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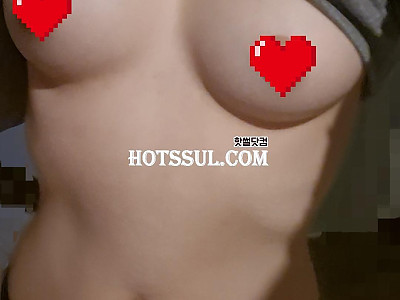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윤지
윤지 lililll
lililll
 비나무
비나무 스타스타
스타스타 바가지
바가지 KEKEKE
KEKEKE 청개구리42
청개구리42 가을향기2
가을향기2 황소87
황소87 도라짱
도라짱 쓰리포인트
쓰리포인트 몽키D루피
몽키D루피 Dududuudud
Dududuudud
 바람꽃
바람꽃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프리프
프리프 미르1004
미르1004 테웨이
테웨이
 sdvsdvsd
sdvsdvsd 박은언덕
박은언덕 덩치
덩치 이고니스존
이고니스존 도톨
도톨 개구리2
개구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