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스러운 아줌마
 조까는
3
629
1
2시간전
조까는
3
629
1
2시간전
그건 1990년대 후반, 강원도 춘천 김유정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그때 20대 중반, 건설 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이름은 철민. 서울에서 내려와 산골 마을에서 일하다 보니, 매일이 고단했다. 공사는 산을 뚫고 도로를 내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소음, 먼지, 진동 – 주민들 불만이 쏟아졌다. 회사 지시로 가가호호 방문해 안내장 돌리고 양해 구하는 게 내 일상이었다. "죄송합니다, 공사 끝나면 편해질 겁니다" 하며 머리 숙이는 게 습관이 됐다.
그날은 늦은 오후,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 가는 시간이었다. 마을 끝자락, 오래된 한옥집들이 모인 동네를 돌았다. 대부분 노인들이나 아줌마들이 사는 곳. 안내장 한 장씩 건네고 인사하면 끝났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다. 문은 허름한 나무 문짝,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고,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 나왔다.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 울음 같기도 한. 나는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도로공사 현장에서 왔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안에서 뚝뚝, 쩝쩝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숨소리? 아니, 더 거칠고 습한 소리. 나는 더 크게 외쳤다.
"도로공사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계세요? 안내장 좀 드릴게요."
그제야 안방 문이 스르륵 열리며 여자 머리가 내밀어졌다. 40대 초반쯤 된 아줌마였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반쯤 풀려 몽롱했다.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고, 숨을 헐떡였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리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쾌락에 젖은 얼굴 – 그건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 순간엔 그냥 아파 보였다.
"아니… 왜요?"
목소리가 떨렸다. 숨이 가빠서 말끝이 끊어졌다.
"공사업체입니다. 저 앞 큰길 공사로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날 테니 양해 좀 구할려고 왔습니다. 안내장 드릴게요."
나는 안내장을 내밀며 물었다. "근데…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 네… 아니요."
그 순간, 그녀의 등 위로 뭔가 솟아올랐다. 검은 털 덩어리, 개 머리였다. 큰 개, 아마 골든 리트리버나 비슷한 종. 눈이 번뜩이며 혀를 내밀고 헐떡였다. 나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설마… 개가 아줌마를 공격하는 건가? 살을 물어뜯는? 본능적으로 신발을 벗고 문을 발짝 열었다. "아줌마! 괜찮아요? 개가…"
안방 문이 활짝 열리며 장면이 드러났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줌마는 상반신만 블라우스를 입은 채, 바닥에 네 발로 엎드려 있었다. 치마는 허리까지 걷어 올려져 있고, 팬티는 내려간 상태. 그 뒤에서 개가 그녀의 엉덩이를 꽉 물린 채, 허리를 세게 흔들고 있었다. 피스톤질 – 개의 붉은 성기가 아줌마의 보지에 깊이 박혔다가 빠졌다를 반복했다. 쩝쩝, 찰싹찰싹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개의 앞발이 아줌마의 등을 짚고, 혀를 내밀며 헐떡였다. 아줌마의 보지에서 투명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개의 자지가 매끄럽게 미끄러졌다.
"아… 아악…!"
아줌마가 소리를 질렀다. 놀라서? 아니, 그건 신음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쾌락에 젖어 있었고, 입에서 침이 질질 흘러내렸다. "으으… 으응…!" 몸이 앞뒤로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출렁였고, 엉덩이 살이 개의 골반에 부딪혔다. 개는 더 세게 박아대며,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다. 아줌마의 보지가 개의 자지를 꽉 물고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바닥을 짚고, 발톱이 마룻바닥을 긁었다.
나는 구역질이 올라왔다. 입을 막고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이… 이게… 뭐…" 속이 울렁거렸다. 개 냄새, 땀 냄새, 섞인 체액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아줌마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그 눈빛에 수치심이 스쳤지만, 곧 다시 풀렸다. "으으… 아… 가지 마… 봐… 더… 더 세게…" 그녀가 중얼거렸다. 미쳤어? 나한테 말하는 건가? 개가 절정에 다다랐는지, 움직임이 빨라졌다. 아줌마의 신음이 커졌다. "아아악…! 와… 와…!" 그녀의 몸이 부르르 떨리며 오르가즘에 도달했다. 개도 곧 사정했다. 하얀 정액이 흘러넘치며 아줌마의 허벅지를 적셨다.
나는 문을 닫고 뛰쳐나왔다. 안내장도 떨어뜨린 채. 밖으로 나와 구토했다. 산골 공기조차 역겨웠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박혔다. 아줌마의 헐떡이는 숨소리, 개의 피스톤질, 침 흘리는 입. 구역질이 났지만, 동시에… 자지가 섰다. 왜? 그 어두운 쾌락, 금기된 행위가 내 속의 뭔가를 깨운 건가. 손으로 자위를 하며 그 장면을 떠올렸다. "으으… 아…" 내 신음이 아줌마의 것과 섞였다.
다음 날, 공사 현장에 가서도 그 집이 눈에 밟혔다. 주민 방문 루틴으로 다시 가야 했지만, 피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회사에서 "그 동네 다시 돌려" 지시가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그 집에 갔다.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이번엔 대답이 왔다. "네… 들어오세요." 아줌마였다. 문을 열자 그녀가 앉아 차를 따라주었다. 얼굴은 평범했다. "지난번에… 죄송해요. 안내장 주시러 왔어요?"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그날… 봤죠? 놀라셨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개… 왜…"
그녀가 속삭였다.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서… 그 애가 위로가 돼요.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개가 핥다가… 그 다음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내 무릎에 닿았다. "당신도… 느껴보고 싶어요?"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그 생각으로 자위를 했다.
공사가 끝날 무렵, 나는 그녀를 다시 찾았다. 문을 열자 그녀가 엎드려 개와 함께 있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지켜봤다. 그녀의 신음이 방을 채웠다. "으으… 봐… 나… 이렇게… 미쳤어…" 구역질이 났지만, 자지가 아팠다. 나는 손을 내려 쥐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산골을 떠났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았다. 밤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나도 언젠가 그런 구멍에 빠질까 봐 두렵다. 하지만… 이미 중독된 건지도 모른다.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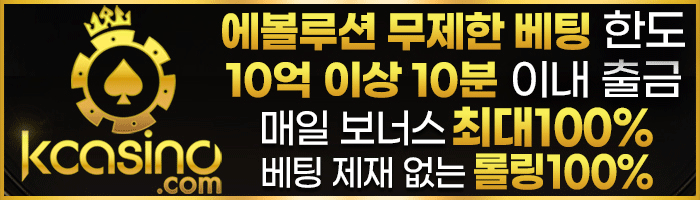





















 NEVADA
NEVADA 존다123
존다123 바람꽃
바람꽃 sohot04
sohot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