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돌싱녀 넉두리
아따, 오늘도 새벽부터 잠이 안 온당께라.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은 눈을 떠부렀제.
이놈의 세상, 나 혼자 사는 게 이리도 시끄럽고도 조용허냐.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타 마시믄,
그 뜨거운 김에 마음이 괜히 허전혀부러.
사람 냄새가 그립다 아이가.
누가 문 열고 “여보” 한마디만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은디 그럴 일은 없제.
이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아따 세상 천지에 나 혼자인 게 자유롭더라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밥 안 해도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웃었제.
헌디 그게 몇 달 가더라고.
그 담부턴 조용한 게 겁나더라고.
집이 이리 큰 줄 몰랐제,
벽이 사람 말 안 해도 울더라고.
퇴근하고 들어와 불 켜믄,
불빛이 허연 게 사람 대신 날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
“어이, 그라제? 오늘도 혼자 왔냐?”
이러는 듯해서 괜히 티비를 켜부렀제.
티비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나는 그 웃음이 멀게 느껴진당께라.
이놈의 세상, 나도 웃고 싶은디
어찌 그리 웃음이 인색하냐.
가끔은 거울을 본당께.
거기 아직 내 얼굴 있더라고.
주름살 몇 개 늘었는디,
그 주름마다 내 세월이 앉았제.
근디 신기한 건, 그 주름이 나쁘지 않더라고.
젊을 땐 그리도 꾸미기 바빴는디,
이젠 립스틱 한 번 바르면 그게 다여.
그것마저도 내 마음이 허락할 때만 허지.
요새는 나한테 “수고했다잉” 이 말이 젤 고맙더라.
점심때 회사 사람들끼리 밥 묵을 적에도,
다들 가족 얘기 허는 거 들으면
속으로는 허허 웃어도
마음 한구석이 찔끔허지.
“아따, 나도 그 시절엔 그랬제.”
남편이 밥 다 묵고 나가믄
빈 그릇에 김치 한 쪽 남은 거 치우던 그 손맛이,
이젠 허공만 긁고 있당께라.
퇴근길엔 늘 같은 길이여.
불빛 환한 카페 앞을 지나믄
젊은 연인들이 붙어앉아 속닥이제.
그 웃음소리 듣고 있노라믄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내려앉아.
그라지만,
나는 이제 그런 거 부럽지도 않다,
허면서도
어째 맘 한켠이 꾸물꾸물허냐.
내 나이 마흔 중반,
몸도 마음도 이젠 알 거 다 아는 나이여.
근디 어찌 세상은 이 나이에
‘여자’ 대신 ‘이모’, ‘아줌마’라 불러부렀을까.
나도 여잔디.
내 안에 아직 뜨거운 피 흐르고,
향기 나는 살결도 있고,
누구 하나 따스히 불러주는 목소리도 그립제.
어느 날,
시장 갔다가 남자 상인이
“아가씨, 이건 그냥 덤으로 드릴게요.”
허는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콩 내려앉더라.
그게 그냥 말인 줄 아는데도,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했제.
누가 내 이름 불러준 것도 아닌디,
그 말 속에 내가 여자라는 게 잠깐 살아났당께라.
저녁엔 가끔 와인 한 잔 따라.
혼자지만,
잔에 비친 내 얼굴 보면서 말허지.
“야, 너 아직 괜찮다잉.”
그럼 진짜로 조금 괜찮아져.
비 오는 날엔 더 그래.
빗소리 들리믄
왠지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당께라.
그때마다 누가 내 손 좀 잡아줬음 싶제.
근디 또 한켠으론 두렵제.
누굴 다시 만나면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문 열고 싶다가도,
결국은 문고리를 꼭 잠그고 만다.
그라지만,
사람이란 게 참 간사허지라.
다음 날 아침이 되믄 또 누굴 기다리고 있더라고.
내가 이래요잉, 참 우습제?
요새는 나한테 잘허는 법을 배우고 있당께라.
좋은 냄새 나는 비누 사다가 목욕할 때마다,
“이게 바로 나여” 허면서.
밥도 예쁘게 차려 먹고,
방에 꽃도 꽂아둬.
누구 보여줄 사람 없어도,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가끔은 옛 남편 생각도 난다.
그 양반, 지금은 어디서 뭐 하려나.
좋은 사람 만나 잘 살면 좋겠제,
근디 이상하게도 미운 마음은 이제 없더라고.
나도 내 길 가야제.
이제 와서 뒤돌아봤자 뭐 혀.
그 시절은 이미 저물어부렀으니께.
그래도 가끔,
꿈속에서 누가 내 이름 부르면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제.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이제는 모르것어라.
사람 마음이란 게 바람 같아서
잡을라 하면 빠져나가불고,
놓으면 슬며시 돌아오제.
나는 오늘도 살제.
밥 해 묵고, 출근허고,
웃고, 일하고, 집에 와서 불 끄고.
그게 다여도, 그 안에 내 인생이 다 있당께라.
그래도 언젠간
누가 내게 다시 와서
“그라제, 니 웃는 거 참 이쁘다잉.”
허는 날이 올랑가 몰라.
그날이 오면
나도 다시 화장하고,
머리 예쁘게 묶고,
그 사람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허고 싶다.
“나, 오래 기다렸다고.”
그리고 웃을 거여.
눈가에 주름이 더해도,
그 주름마다 내가 버틴 날들이 담겨 있으니께.
그라제,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것냐.
넘 외로워도,
결국은 그 외로움이 날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여.
내일은 조금 덜 외로우면 좋겠다잉.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잘란다.
이불 속에서,
내 마음도 같이 따뜻해졌으니께라.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 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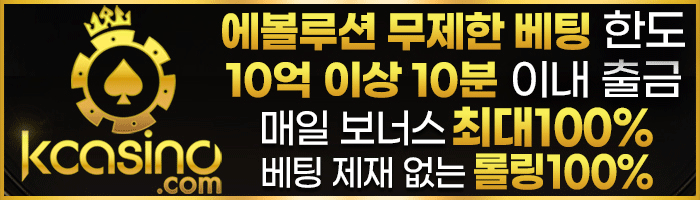



 머어신
머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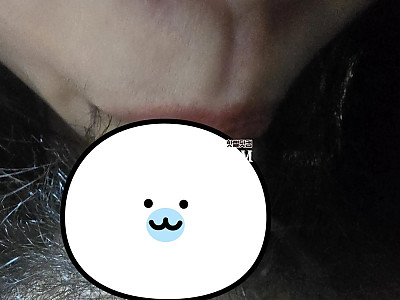





 NEVADA
NEVADA 가을향기2
가을향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