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그녀 8
 로맨틱가이
32
1326
15
2025.10.13 20:20
로맨틱가이
32
1326
15
2025.10.13 20:20
그 사건 이후, 나는 그녀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가끔은 정말 필요한 일로만, 정말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송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좌 변경사항 전달드려요.”
그런 식의 문장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철저히 사무적인 문장들만 오갔다.
그녀는 늘 빠르고 정확하게 답장을 보냈다.
‘확인했습니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딱 그 두 문장 안에서만 우리의 관계는 존재했다.
그 이상은 없었다.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적도 있었다.
“시간 괜찮으면 식사라도 하죠.”
그녀는 예의 바르게 거절했다.
“죄송해요. 일정이 좀 어려워서요.”
그 한 줄에, 모든 가능성이 닫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렵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사업이 갑자기 기세를 탔다. 수주가 이어졌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 잠을 줄이고 일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기에, 그 공백을 일로 메우려 했는지도 몰랐다.
짧은 기간에 꽤 큰 돈이 들어왔다. 그때 문득 그녀가 떠올랐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이유로. 나는 회사 자금 일부와 은행에 맡겨둔 개인 계좌 자금을 모두 그녀의 지점으로 옮겼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에 법인 계좌도 귀 지점으로 이전했습니다. 관리는 맡기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완벽했다. 딱 그만큼만, 아무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정중했고, 나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에도 그녀와의 대화는 늘 사무적인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그녀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얻었다. 비록 손 닿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녀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착각. 그 착각이, 내게는 충분했다.
때로는 사랑보다, 그냥 그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그때의 나는 바로 그 시기에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중 펜데믹이 터졌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 였지만 나에겐 그녀와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다.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Comments

 RIO CASINO
1시간전
RIO CASINO
1시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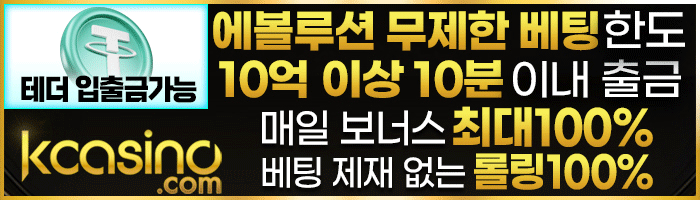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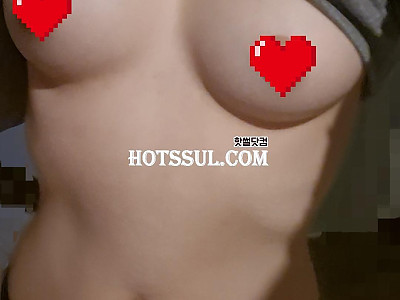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KEKEKE
KEKEKE
 시디정지영
시디정지영 오씨바놈
오씨바놈 dfgxjdi
dfgxjdi 가을향기2
가을향기2 더나가
더나가 훈제오리
훈제오리 코스
코스 국화
국화 테웨이
테웨이 진상모드
진상모드 닉스890
닉스890 불랴요ㅗ년
불랴요ㅗ년 계명04
계명04 j012372
j012372 다이아몬드12
다이아몬드12
 몽도령
몽도령 니노니
니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