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죽이는 새댁 - 상편
 빅송이
0
130
0
50분전
빅송이
0
130
0
50분전
우리 집은 2층으로 된 단독 주택. 1층은 우리가 살고 2층은 세를 냈다. 세를 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자주 사람들이 바뀐다.
그래서 2층에 원래 살던 남자 대학생들이 애먹이다 나가고
이번엔 신혼부부가 들어 온다기에 은근한 기대를 하고 짐을 옮길 때 도와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당시 휴학 중이어서 일을 좀 하려 했으나 한 달쯤 막노동을 하고 나니
온몸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집에 죽치고 좀 심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계십니까?”
신혼부부가 도착했다. 둘은 곰돌이 인형이 그려진 커플티를 입고 있었는데 내 시선은 바로 여자 쪽으로 갔다.
나이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165의 적당한 키에 무척 이쁘단 생각이 들었다.
특히 호리병처럼 잘록한 허리에 탱탱한 엉덩이가 무척이나 탐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는 준비해둔 키로 2층 문을 따주고 건네주었다.
막상 도와주려 했는데 이삿짐 아저씨들이 후다닥 짐을 옮기길래 나는 멀찍이 구경을 하였다.
특히 새댁 누나가 탐스러운 엉덩이를 움직이며 계단을 오를 때에, 그리고 손수 작은 짐을 옮기느라 면티 안으로 흔들리는
가슴을 보았을 때 나는 내 몽둥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신혼부부는 밥 먹다가도 하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을 때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저 누나도 2층에서 그러겠지 하는 생각에 더욱 흥분되었다.
막노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이 활성화가 되었는지 집에서 빈둥빈둥 쉬고 있으려니 몸이 근질근질하기도 하고
수시로 몽둥이가 핏대를 올려 나는 바지에 손을 넣어 주물럭거리면서 괜히 마당으로 나가 2층 계단과 문만 뚫어지라 관찰했다.
`아우 씨, 새댁 누나 먹고 싶다.`
남편은 회사에 갔는지 아침 7시가 좀 넘으면 벌써 집을 나선다.
내 방에서 창문으로 살짝 엿보면 원피스를 입은 새댁 누나는 남편을 바래다주고
이제부터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계단을 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림동에 있는 가게에 출근하면 나는 혼자 있을 때 충동심이 벌컥 생겼다.
‘비상키로 그냥 문을 따버릴까.’
하지만 도저히 그럴 용기는 생기지 않았다. 한번 맛보려다가 산통 다 깨지는 수가 있으니 말이다.
나는 내가 사고 칠까 봐 방지책으로 준비해둔 빨간색 *** 테잎을 상영하면서 언제나처럼 제일 야한 장면에서 밤꽃 액을 뿌렸다.
몇일 뒤.
“딩동딩동.”
나는 설마 하고 계단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들어서는 새댁 누나를 창문으로 내려다보는데 누나가 1층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깜짝 놀라 옷을 추스리고 문을 열어 주었다.
“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열쇠를 잊어버려서 그런데 비상키 좀 복사하고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복사해다 드릴게요.”
“아, 괜찮은데요.”
“아우, 제가 남는 게 시간이라서요. 누나.”
나는 끝에 ‘누나’라는 말을 붙여 괜히 친한 척 해보았다. 약발이 먹혔는지 누나의 표정이 좀 더 밝아졌다.
“학생인가 봐요?”
“네네, 제가 지금 휴학 중이라서요.”
이렇게 대화의 문이 트이고 내가 얼른 열쇠를 복사해서 새댁 누나한테 갖다 바치자 누나는 반갑게 맞아 주었다.
“잠깐만 주스라도 한잔해요.”
나는 절대 사양하지 않고,
“아, 누나 기다렸어요.”
누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민수라고 하는데요. 누나, 말 놓으세요.”
나는 새댁 누나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따라준 주스를 오래 마시고 싶어
소파에 엉덩이를 파묻고 누나의 몸매를 슬쩍슬쩍 엿보면서 뜸을 들였다.
“누나, 또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삐삐 치세요. 바로 달려올게요.”
그로부터 사흘 뒤.
“으…아우…우우.”
아무도 없겠다, 햇볕도 좋아 나는 현관문을 열어 둔 채로 거실에서 또 포르노를 보며 한껏 똘똘이를 흥분시켜 가고 있었다.
“저기, 민수 동생….어머머.”
고개를 돌려보니 새댁 누나가 포도를 가득 담은 그릇을 든 채 현관 신발장 앞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나는 웃통을 벗고 팬티를 한쪽 다리에만 걸치고 벌겋게 달아오른 몽둥이를 잡은 채로
음란할 대로 음란한 포르노의 클라이맥스 부분을 보는 중이었다.
“어엇..”
나는 불행하게도 그때 절정에 달해 밤꽃 액을 발사하는 찰나였다. 찍. 찍.
나는 누나를 보면서 미처 휴지를 몽둥이에 틀어막지 못하고 손으로 틀어막다가 밤꽃 액이 손가락 새로 벌컥벌컥 터져 나왔다.
그 모습까지 지켜본 새댁 누나는 드디어 사태 파악을 하고 민망해하며 어찌할 줄 모르다가, 모기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 좀 먹어.”
하고는 거실 바닥에다 그릇을 놓고 2층으로 후다닥 올라갔다.
“아우…씨…하필…누나.”
나는 정말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에이 빙신.”
나는 나 스스로 머리를 쿡쿡 쥐어박으면서 자책했다. 그런데 잠시 뒤 웬일인지 몽둥이가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다.
홀딱 벗고 코브라 대가리처럼 빳빳하게 세운 내 몽둥이를 누나가 잠시동안 멍하니 보고 있었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누나는 그때 뭔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나는 궁금해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얼른 포도 세 송이 중 한 송이를 먹고 두 송이는 냉장고에 넣어 둔 채 빈 그릇을 들고 2층으로 향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의 용기가 가상하다. 딩동딩동.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잘…먹었어요.”
내가 인사를 건네자 누나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약간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어, 어응.”
“저기…누나…심심한데 좀 놀다 갈게요.”
누나는 어깨가 들썩했으나 하는 수 없다는 듯 힘없이 몸을 비켜섰다.
나는 하늘하늘한 원피스만 입은 누나의 곁을 스치면서 누나의 체취를 맡았다.
누나는 연신 어색한 몸짓으로 TV를 틀어주고 거실 한쪽에 있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다.
원피스는 하얀 목이 잘 드러났고 누나의 탐스러운 엉덩이를 잘 씌워주고 있었다.
“포…도, 좀 더 줄까?”
“아니, 누나 배불러. 뭐 해요? 일루 좀 와 보지.”
“으응, 왜? 말해.”
나는 갑자기 이상한 용기가 생겼다.
“누나…아까 그거 빌려줄까요? 아까 그 비디오.”
허걱. 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인가.
| 이 썰의 시리즈 (총 2건) | ||
|---|---|---|
| 번호 | 날짜 | 제목 |
| 1 | 2025.11.24 | (펌) 죽이는 새댁 - 하편 |
| 2 | 2025.11.24 | 현재글 (펌) 죽이는 새댁 - 상편 |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 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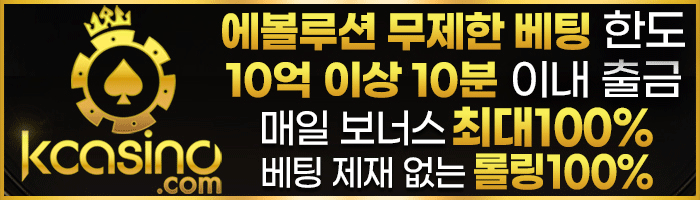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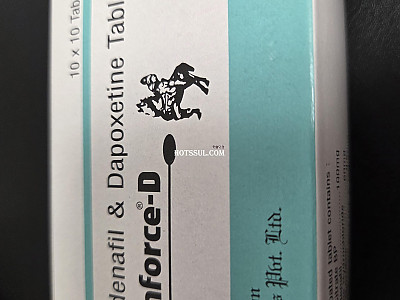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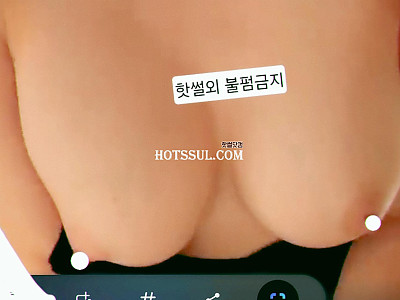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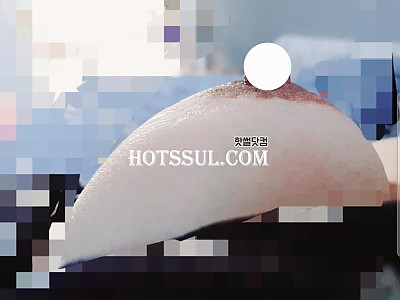

 윤지
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