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인생살이 6
 조까는
1
143
0
2시간전
조까는
1
143
0
2시간전
중3 때 였나? 가을 바람이 이미 차가워지기 시작한 저녁 7시 무렵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도 하늘이 아직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시골 마을 길에는 벼 말리는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도로 양쪽에 널린 황금빛 벼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가끔 끊어지듯 들려왔다. 공기 중엔 볏짚 타는 듯한 건조한 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저녁 밥 짓는 연기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학교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10m쯤 앞에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곧은 실루엣. 치마가 바람에 살짝 날리며 다리가 드러날 때마다 탄탄한 종아리가 보였다. 정식이 누나였다. 원주 00모직 공장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공장 생활로 다져진 몸매는 시골 여자치고는 날씬하면서도 곡선이 살아 있었다. 얼굴은 그렇게 예쁘진 않았지만,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이 두툼해서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매력이 있었다. 20대 중반, 아직 결혼 전인 나이.
그녀가 갑자기 동네 창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왜 저쪽으로 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창고는 오래된 나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마당에 우리 집 벼가 널려 말리고 있었다. 볏단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내고, 그 사이로 저녁 햇살의 마지막 빛이 스며들어 황금빛으로 빛났다.
창고 옆 골목으로 들어가니 그녀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있었다.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중이었다. 따르륵…… 하는 소리가 조용한 저녁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허벅지 안쪽으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게 보였다. 그녀의 엉덩이가 살짝 드러나고,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며 더 많은 피부를 보여줬다. 그 순간 내 아래가 불끈 솟아올랐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달려 나갔다. 그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잡아당겨 벼 더미 위로 밀쳤다. 그녀가 "야, 뭐야!" 하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이미 그녀의 눈빛에 호기심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나는 그녀의 치마를 더 걷어 올리고, 팬티를 완전히 벗겨냈다. 그녀의 보지가 아직 소변으로 축축하게 젖어 반짝였다.
“누나… 나 참을 수 없어.”
나는 바지를 내리고 자지를 꺼냈다. 이미 단단하게 선 그것이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스쳤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여기서… 미쳤어? 누가 보면…”
하지만 그녀의 손이 이미 내 자지를 쥐고 있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이 위아래로 움직이자, 귀두에서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몸을 살짝 비틀며 다리를 벌렸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천천히 밀어 넣었다. ‘쑤욱……’ 하는 젖은 소리와 함께 뜨거운 압력이 자지 전체를 감쌌다. 그녀의 안은 공장 생활로 단련된 듯 탄력 있고, 축축하게 자지를 빨아들이는 느낌이었다.
움직일 때마다 볏단이 바스락거리고, 그녀의 신음이 저녁 바람에 실려 퍼졌다.
“아… 천천히… 아파… 아니… 좋아…”
나는 그녀의 가슴을 블라우스 위로 주무르며 속도를 높였다. 그녀의 젖꼭지가 단단하게 서서 옷감 위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녀가 내 등을 할퀴며 허리를 들썩였다. 벼 냄새와 그녀의 땀 냄새, 체액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의 안쪽 벽이 자지를 문지르며 조여올 때마다 찌릿한 쾌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그 순간, 창고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벼를 정리하러 오신 거였다. 어머니가 볏단 사이로 우리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나는 자지를 빼지도 못한 채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로 얼어붙었다. 정식이 누나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치마를 급히 내리려 애쓰며 몸을 웅크렸다. 어머니의 눈에서 레이저처럼 불꽃이 튀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바지를 올리려다 손이 떨려 제대로 안 됐다. 우물쭈물 서 있는데, 어머니가 정식이 누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알았지?”
정식이 누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울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했다.
“정식이네 집에서. 며칠 전 땅 얘기 하러 왔었는데… 이 일로 그 땅 그냥 줘버릴 테니 어디가서 절대 말하지 말고 알았지.”
그날 밤, 어머니가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쇠스랑 자루를 들고 나를 불렀다. 등과 엉덩이를 몇 번 내리치셨다. 아팠지만, 그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다. 그런데 아버지도 결국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길바닥에서 뭐 하는 짓이냐? 개새끼도 아니고… 남자니까 하고 싶기는 하겠지. 그럼 사람들 안보이는데 가서 하던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어쩔 뻔했냐?”
그 말로 끝이었다. 맞은 자국은 며칠 가고, 부끄러움은 더 오래 남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래도 욕망은 멈추지 않았다. 연합고사를 보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내 휘황찬란한 일대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 가을 저녁 창고 앞 벼 더미 위에서 느꼈던 뜨거운 압력과 부끄러움의 맛은, 평생 잊히지 않을 터였다.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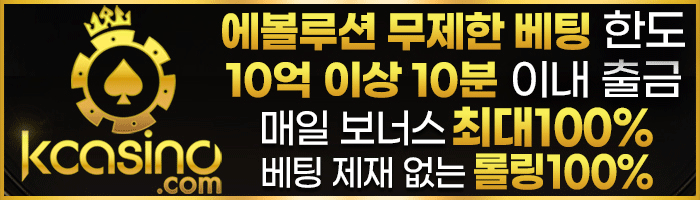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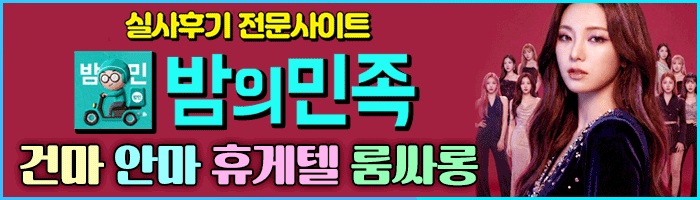



















 윤지
윤지 비틀자
비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