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인생 살이
 조까는
35
1969
20
01.20 16:15
조까는
35
1969
20
01.20 16:15
197*년 3월, 아직 산골에 봄기운이 제대로 돌지 않은 추운 새벽이었다.
강원도 원주 우산동. 해발 400미터가 넘는 산자락에 붙어 있는 작은 마을.
새벽 안개가 계곡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다 해가 살짝 떠오르면서 서서히 흩어지는 그 시간, 낡은 한옥 지붕 위로 닭 우는 소리가 먼저 퍼졌다.
3남 3녀 중 다섯째. 고조할아버지가 철종 때 정2품 벼슬을 하셨다는 이야기, 한때 한양에 집이 있고 논밭이 수십 마지기나 됐다는 전설 같은 말들. 하지만 지금은 그 영광이 다 흩어진 뒤였다. 남은 건 기와지붕 한옥 한 채와 산 몇 필지, 그리고 마당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와 배나무뿐이었다.
00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불같은 장난기를 타고났다. 기어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마당 흙을 파헤쳐 개미집을 무너뜨리고, 닭장을 열어 닭들이 날뛰게 만들고, 여름이면 계곡으로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며 온몸을 흠뻑 적셨다. 키는 또래보다 훨씬 빨리 컸고, 어깨도 넓어졌다. 마을 어른들은 “저놈은 장차 큰 인물이 되겠다”면서도 “저놈 때문에 골치 아프겠다”며 혀를 찼다.
그리고 국민학교 입학 날이 왔다. 00은 아직 만 6살, 생일이 3월이라 빠른 입학 연령이었다. 그날 새벽, 아버지는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파란색 책가방을 꺼냈다. 앞면에 그랜다이저 로봇이 큼지막하게 그려진, 당시로선 값비싼 물건.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다. “00야… 이거 메고 학교 가라. 공부 잘해서… 할아버지처럼 벼슬도 하고, 우리 집안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00은 책가방을 받아 들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가방이 등에 닿을 때마다 로봇의 눈이 반짝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찼다. “아빠, 나 진짜 학교 간다!”
산길을 따라 학교까지 40분. 흙길은 비 온 뒤라 질퍽했고, 새 신발에 진흙이 달라붙었다. 운동장에 도착하니 이미 마을 아이들과 동네 형들이 모여 있었다. 입학식은 간단했다. 교장선생님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국기 게양, 애국가. 그리고 교실로.
1학년 1반. 나무 책상은 오래돼서 구석구석이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고, 창틀에는 오래된 신문지가 붙어 바람을 막고 있었다. 선생님이 출석부를 펼쳤다. “김철수!” “네!” “박민지!” “네!”
하나둘씩 대답이 이어지는데, 00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00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저는요? 저 안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출석부를 다시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00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했다. “출석부에 네 이름이 없는데…”
그때 교실 맨 뒤, 동네 형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쟤 7살이에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아버지가… 학교 가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00의 손을 잡았다. “교무실로 가자.”
교무실. 교장선생님이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내려다봤다. “취학증명서가 안 나와서 입학이 안 됐구나.” 00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학교 가라고 하셨어요…” 교장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우산면 사무소 가서 면장님 도장 받아 와. 그거 없인 못 들어와.”
00은 다시 산길을 내려갔다. 이번엔 혼자였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뛰었다. 숨이 차올랐다. 면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 열자 담배 냄새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면장님은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시다가 00을 보고 빵 터졌다. “야, 꼬마야. 무슨 일이냐?” 00이 숨을 헐떡이며 설명하자 면장님은 더 크게 웃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00 아버지 되시죠? 아들내미가 여기 와서 난리인데요…”
그날 저녁, 집에는 선생님 두 분과 면사무소 직원 세 명이 왔다.
어머니가 끓인 감자탕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산나물 무침 접시가 순식간에 비워졌다. 어른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었고, 00은 그 한가운데서 책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나 이제 진짜 학생이야…’
6년 동안 국민학교는 00의 전성기였다. 시험은 늘 100점. 수학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떠올랐고, 국어 시간엔 선생님이 읽어주는 동화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 발표했다. 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쑥쑥 자라 6학년 때는 거의 170에 가까웠다. 운동회 달리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 거의 모든 종목에서 1등. 하지만 장난도 그만큼 컸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을 모아 “보물찾기” 한다며 뒤산으로 올라가다 길 잃어 해 질 때까지 헤맸다. 겨울이면 눈덩이로 창문을 깨먹고, 여름이면 계곡 물총 싸움으로 선생님 구두를 흠뻑 적셨다.
가장 아프고도 오랫동안 회자되는 말썽은 동네 누나 사건이었다. 작은형의 동창 ‘형*누나’. 마을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였다. 피부는 하얗고, 눈은 크고, 웃을 때 보조개가 패였다. 나중엔 미스코리아 도전에 나가 미(美) 상을 받을 만큼 미모가 뛰어났다.
그날은 여름 한낮,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날이었다. 00은 친구들과 대나무 숲에서 활을 만들었다. 대나무를 쪼개고, 실로 묶고, 끝에 대나무로 살을 만들었다. 제대로 만든 활은 20미터도 넘게 날렸다. 형*누나는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흰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 올리고, 머리를 묶은 모습이 햇빛에 반짝였다.
00의 가슴에 장난기가 불타올랐다. “야, 저기 형*누나 맞추면 영웅 된다!” 친구들이 “미쳤어?” 하며 말렸지만, 00은 이미 활을 당기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쏴아아!”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퍽! 형*누나의 눈썹 바로 위, 이마가 살짝 찢어졌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렀다. 누나는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00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저녁, 형*누나 어머니가 00네 집으로 쳐들어왔다. “너 이 새끼! 우리 딸 얼굴 망쳤어!” 어머니는 00의 귀를 잡아 뜯으며 울부짖었다.
후에 형*누나 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형* 미스코리아에서 미밖에 못 탔어! 그 흉터 때문에 1등은 꿈도 못 꿨어!”
00은 고개를 푹 숙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땐… 그냥 장난이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였다.
지금도 그 흉터는 희미하게 남아 있다. 형*누나 어머니는 00을 볼 때마다 여전히 말한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우산동의 산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분다.
그 바람 속에 00의 어린 시절은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다.
| 이 썰의 시리즈 (총 5건) | ||
|---|---|---|
| 번호 | 날짜 | 제목 |
| 1 | 2026.01.30 | 나의 인생 살이 14 (15) |
| 2 | 2026.01.20 | 현재글 나의 인생 살이 (35) |
| 3 | 2025.12.16 | 나의 인생 11 (10) |
| 4 | 2025.12.16 | 나의 인생 10 (11) |
| 5 | 2025.12.16 | 나의 인생 9 (8) |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Com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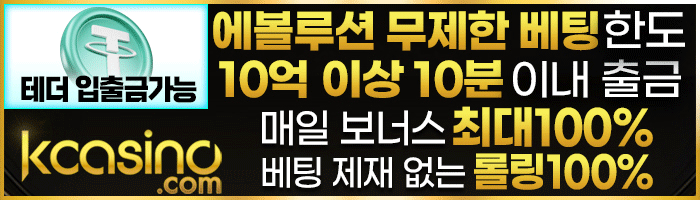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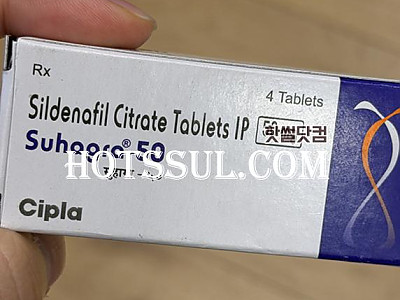











 BET38
BET38 테웨이
테웨이 국화
국화 dmku
dmku 로얄샬로뜨
로얄샬로뜨
 아네타
아네타 빨간고추
빨간고추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프리프
프리프 닉넴은또뭐하나
닉넴은또뭐하나
 푸리리룽
푸리리룽 개구리2
개구리2 검스살스커스
검스살스커스 윤빵
윤빵 햇살속의그녀
햇살속의그녀 비홍
비홍 민지삼춘
민지삼춘
 은낭
은낭 Kong
Kong 쏭두목
쏭두목 박은언덕
박은언덕 너나놔와우리아나
너나놔와우리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