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인생 10
 조까는
11
762
16
2025.12.16 17:02
조까는
11
762
16
2025.12.16 17:02
제주도 헌병 생활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처음엔 교수님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 때문에 시작된 방탕함이었는데, 나중엔 습관이 됐다. 헌병이다 보니 부대 안팎을 오가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과정에서 이쁘장하거나 눈에 들어오는 여성은 나이를 불문하고 다 건드렸다.
간부식당에서 밥해주던 아줌마. 40대 중반쯤 됐는데,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게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근무 끝나고 식당 정리 도와준다고 들어가서, 불 꺼진 주방에서 벽에 기대 키스하고, 그 뒤로 몇 번 더… 그녀는 “너 군대 생활 힘들지? 아줌마가 위로해줄게” 하면서 웃었다.
군기과장 마누라. 과장님이 주말 근무 나가실 때면 부대로 면회 오던 분. 30대 후반, 몸매가 탄탄하고 말투가 세련됐다. 면회실에서 과장님 기다리다 지루해하면 내가 슬쩍 다가가 말을 걸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하면서 헌병실로 데려갔다. 그 뒤 창고 뒤편에서… 그녀는 남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그저 내 품에 안겨 숨을 헐떡일 뿐이었다.
보급대 물품 관리하는 아줌마도 있었다. 물자 창고에서 서류 확인 도와준다고 들어갔다가, 선반 뒤에서 자연스럽게… 그녀는 “너 진짜 대담하다” 하면서도 내 손을 잡아끌었다.
면회 와서 남자친구나 남편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여성들도 있었다. 학생부터 20대 후반 직장인까지. 면회실에서 실망한 얼굴로 나오면 내가 “괜찮으세요?” 하면서 다가가 위로하고, 위병소 뒷편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오는 외로움과, 제복 입은 내 모습에 쉽게 마음을 열었다.
휴가 나올 때면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다. 비행기 표 끊는 돈으로 제주에서 펜션이나 호텔을 잡고, 전에 알던 여자들을 불렀다. 관광 왔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부대 근처에서 만난 현지 여자들도 있었다. 밤바다 보면서 술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새벽까지 몸을 섞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낯선 여자가 누워 있고, 나는 또 빈 가슴으로 창밖 바다만 바라봤다.
그때는 그게 위로인 줄 알았다. 누군가를 안고, 뜨거운 살을 느끼고, 순간이라도 외로움을 잊는 게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실제론… 점점 더 텅 비어갔다.
교수님을 잊으려 애쓸수록, 그 빈자리가 더 커졌고, 나는 그 구멍을 채우려 몸부림치다 결국 더 깊이 빠져들었다.
제주 바다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나는 가장 어두운 밤들을 보냈다.
그리고 전역이 다가올수록, 이 모든 방탕함이 결국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군 생활 막바지, 그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부대에 왔었다. 우정의 무대.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사회 보시고, “자,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병사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면 관객석에서 우르르 뛰어나가는 그 프로그램. 다들 알지.
그날 출연진이 정말 미쳤다. 룰라, 엄정화, 신효범, 쿨… 그리고 또 한 명,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정말 존나 예뻤던 여가수 한 명 더 있었다.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 부를 때 조명 맞고 머리 휘날리는 모습이… 제주도에서 1년 넘게 여자 얼굴 제대로 못 본 놈들 눈에선 불이 났다.
공연 끝나고 부대 내 화장실은 밤새 울었다. 진짜로. 샤워장, 변소 할 것 없이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벽까지 들렸다. “엄마…” “집에 가고 싶다…” 하면서 울먹이는 놈들 천지였다. 나도 그날 밤, 벙커 침대 위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흘렀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그 예쁜 가수들 얼굴이 뒤섞여서.
그리고 드디어 전역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가슴이 벅찼다. 빨리 학교로 돌아가서 동아리 방 가고, 기타 잡고, 다시 무대 서고 싶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예전 그 모습이 아니더라.
내가 다닐 때만 해도 동아리는 목숨 걸던 곳이었다. 합주 한 번에 새벽 4시까지, 공연 한 번에 한 달 밤샘 연습. 축제 때마다 대운동장 무대 흔들고, 정기공연마다 강당 꽉 채우고… 1년에 10번은 기본으로 공연했다. 그때 우리는 진짜로 음악에 미쳐 있었다.
근데 전역하고 돌아오니… 완전 취미생활 수준이었다. 연습도 설럴설렁, “오늘 피곤해서 일찍 끝내자”가 기본. 공연은 1년에 3~4번? 신입생들은 기타 코드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재미로 하자” 분위기. 옛날 우리 때 그 열정, 그 불꽃은 온데간데없었다.
속이 타들어갔다. 내가 제주도에서 이를 악물고 버틸 때, 여기선 이렇게 느슨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옛 동기들 다 불렀다. 나 포함 오상기, 강기원, 김승유, 김상훈, 장승택… 우리 원년 6명. 다 전역하고 사회 나간 놈도 있었지만, “야, 한 번만 더 모이자” 하니까 다들 “하자”고 답이 했다.
“다시 한번 뭉쳐서 공연하자.”
우리는 다시 체육관 뒤편 그 낡은 연습실에 모였다. 기타 줄 새로 끼우고, 드럼 헤드 갈고, 앰프 먼지 털면서… 옛날처럼 새벽까지 합주했다. 세트리스트는 옛날 곡들로만 짰다. Metallica, Yngwie, Nirvana… 그리고 우리만의 오리지널 곡 하나.
그 공연은 동아리 정기공연이 아니라, 그냥 우리 6명을 위한 무대였다. 학교 후배들은 구경만 했고, 우리는 그날 다시 한 번 그때 그 느낌을 되살렸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 쥐고 노래 부를 때, 제주도에서의 모든 외로움과 방탕함이 잠시 잊혔다.
우리는 여전히 그때 그 락밴드였다. 그리고 그 무대가, 내 청춘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 이 썰의 시리즈 (총 5건) | ||
|---|---|---|
| 번호 | 날짜 | 제목 |
| 1 | 2026.01.30 | 나의 인생 살이 14 (10) |
| 2 | 2026.01.20 | 나의 인생 살이 (28) |
| 3 | 2025.12.16 | 나의 인생 11 (10) |
| 4 | 2025.12.16 | 현재글 나의 인생 10 (11) |
| 5 | 2025.12.16 | 나의 인생 9 (8) |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Comments

 RIO CASINO
1시간전
RIO CASINO
1시간전

 AVEN CASINO
1시간전
AVEN CASINO
1시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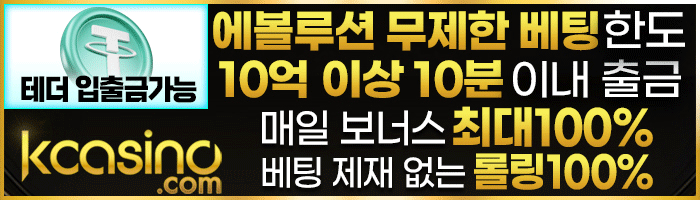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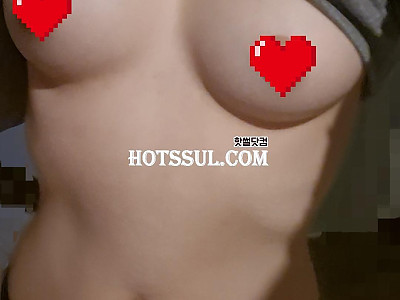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큰등바다
큰등바다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테웨이
테웨이 김성우
김성우 아네타
아네타 스위치
스위치 다이아몬드12
다이아몬드12 파룬킁킁
파룬킁킁 이고니스존
이고니스존 koongdi
koong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