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인생살이 38
 조까는
3
178
2
4시간전
조까는
3
178
2
4시간전
그날 밤, 나는 완전히 녹아내렸다.
올레나, 그녀의 엄마, 여동생까지 세 명이 내 몸을 나눠 먹듯이 탐했다. 입, 손, 보지, 가슴… 모든 구멍과 피부가 내 좆과 손가락, 혀에 의해 채워지고 빨리고 문질렸다. 올레나는 여성상위로 올라타서 허리를 앞뒤로 흔들며 “Ох… так глибоко… я не можу… ще… ще раз…” (아… 너무 깊어… 못 참아… 또… 또…) 하며 세 번 연속으로 경련했다. 그녀의 보지가 좆을 꽉 물 때마다 애액이 내 배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는 뒤에서 내 고환을 빨고 여동생은 내 유두를 깨물며 세 여자의 신음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새벽 4시쯤 됐을까. 나는 완전히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다. 몸이 무거웠다. 근육 하나하나가 녹아내린 듯했다. 우크라이나 밭에서 김매는 아줌마도 김태희라고 불릴 정도의 미모와 몸매를 가진 올레나 모녀의 오럴과 보지 기술은 진짜… 김태희가 뺨 맞고 다운될 수준이었다.
아침 늦게 눈을 떴다.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빠질 것 같았다. 간신히 일어나 샤워실로 들어갔다. 찬물로 몸을 식히려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올레나의 엄마가 들어왔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아무 말 없이 샤워실 바닥에 쪼그려 앉더니 쉬를 하기 시작했다. 황금빛 줄기가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Доброго ранку… не соромся…” (좋은 아침… 부끄러워하지 마…) 그러더니 일어나서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급하게 등을 돌리고 샤워기를 틀자 갑자기 얼음장 같은 찬물이 쏟아졌다. “어… 헉!”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엄마는 크게 웃으며 내 몸을 붙잡았다. “Ой, вибач… холодно?” (아, 미안… 춥지?) 그러더니 샤워기를 조정해서 따뜻한 물로 바꿨다. 따뜻한 물줄기가 쏟아지자 나는 한숨을 내쉬며 샤워를 시작했다.
엄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내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손바닥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엉덩이 살을 주물렀다. 그러더니 손이 앞으로 와서 내 좆을 살짝살짝 어루만졌다. 이미 지쳐 있었는데도 그 손길에 좆이 다시 피어올랐다.
엄마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었다. “Знову великий… мама любить…” (또 크네… 엄마 좋아…) 그러더니 입에 넣었다.
그 순간부터 40년 넘게 갈고닦은 장인의 오럴 기술이 시작됐다.
휘몰아치기. 혀가 좆대를 따라 빠르게 회전하며 귀두를 세게 빨아들였다. 베어물기. 입술로 좆 중간을 세게 물었다가 놓으면서 혀로 귀두를 때렸다. 요도구 핥기. 혀끝으로 요도구를 찔러보듯 핥으며 안쪽까지 자극했다. 그리고 입안에 침을 가득 모아서 귀두만 빨아들이는 기술… 청룡열차라고 하나? 그 고난이도 기술을 부렸다.
나는 금방 사정할 것 같았다. 대한민국 청년 해병대의 자존심을 걸고 버티려고 용을 썼다. 하지만…그 자존심은 장인 앞에선 좆도 아니었다.
“허… 흑…” 나는 울었다. 비참함이 밀려왔다. 엄청난 정액이 뿜어져 나왔다. 엄마는 그것을 모두 받아먹으며 “Добре… все мені…” (좋아… 다 엄마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사정 후에도 혓바닥을 돌리며 청룡열차를 태워줬다.
나는 한국말로 지껄였다. “이 쌍년아… 그만해라 씨발년아… 엉엉…”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 번 날 쳐다보더니 최고의 고난이도 기술을 부렸다. 입안에 침을 가득 모아서 귀두만 빨아들이는 기술… 나는 한 대 때릴 뻔했다.
샤워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10분 동안 떨었다. 저 고수는 뭐하는 사람인가? 엄청난 절대신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패하려 태어난 고수가 맞다. 감히 말한다. 지금껏 50년 동안 수많은 여자를 따먹고 다녔지만 저 분은 넘버 원이다.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기술을 흉내내지 못하리라.
샤워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입으려는데 힘이 없었다. 손 하나 꼼짝 못 할 지경이었다. ‘그냥 여기서 살까? 여기 눌러있을까?’ 그럴 순 없다. 대한민국 청년 해병대를 전역한 무적 해병이 이까짓 것으로 결심을 포기하다니… 절대 안 된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옷을 입고 그 집을 나왔다.
키예프-바르샤바 야간 열차를 타고 폴란드로 건너가는 동안 나는 시체가 되었다. 정말 시체였다. 아무것도 못 하고… 잠만 잤다.
바르샤바에 도착해서야 다시 움직였다. 폴란드는 공산주의 소련 붕괴 후 사회주의 사상이 아직 틀을 잡고 있었다. 빈곤함은 최악이었다. 둘러볼 데라고는 대부분 2차 세계대전 관련 장소뿐이었다. 그래도 머나먼 동유럽까지 왔으니 구경은 해야지.
바르샤바 구시가지 왕궁, 크라쿠프 역사 지구, 폴란드 북쪽 말보르크 성(Malbork Castle)을 돌았다. 특히 말보르크 성의 벽돌 축조 형태는 불가사의했다. 벽돌이 축하중만을 받는 구조인데 중세에 대포를 어떻게 막았을까? 여행 와서도 건축물 구조만 따지고 있었다. 어쩔 수 없는 노가다 인생이었다.
폴란드 여자들도 너무 예뻤다. 백인들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 1000PLN(당시 1PLN ≈ 280원)이면 폴란드 미인대회 우승자도 따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루 노동자 임금이 120PLN이었던 시대였다. 거리에는 일용직이라도 하려고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가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주부들과 남편들의 고통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의 표정은 무서웠다.
올드타운 광장에서 숙소를 물어보려고 아줌마에게 다가서니 주변 여자들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였다.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내 손을 이끌고 “Chodź, u mnie переночujesz…” (이리 와, 우리 집에서 자…) 라고 하더니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아줌마의 손이 내 팔을 잡고 이끌 때, 그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폴란드 거리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더 깊게 보였다. 그 주름은 단순한 나이테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새긴 흔적 같았다. “Dom… mój dom…” (집… 내 집…)라고 중얼거리며 그녀는 나를 데려갔다. 거리에는 일용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다. 아줌마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그 속에 담긴 기쁨이 느껴졌다. 그녀의 집에는 11살 딸과 7살 아들이 있었다. 아줌마가 내가 잘 방을 안내해 주니 애들이 안내해 줬다.
아들과 딸은 너무 귀여웠다. 다 헤진옷을 입고 있었지만...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오랬만에 저녁식사을 할수 있어서 좋은가 보다.
50PLN 두 장을 애들 손에 쥐어줬을 때 그 애들의 눈이 커지며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집은 정말 허름했다. 벽은 오래된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나무가 삐걱거렸으며, 공기 중에 습기와 오래된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다. 11살 여자애와 7살 남자애가 문 앞에 서서 날 쳐다봤다. 그 애들의 눈은 호기심과 피곤함이 반반 섞여 있었다. 아줌마가 애들을 방으로 데려가며 “Dziękuję ci… bardzo dziękuję…”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반복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줬다.
저녁 식사 시간. 애들한테 준 돈으로 사온 고기로 만든 kiełbasa (키에우바사) 소시지 요리와 gołąbki (골롬키)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아줌마는 맥주잔에 맥주를 따라주며 “Na zdrowie…” (건배…)라고 말했다. 나도 먹었지만, 애들은 미친 듯이 먹어댔다. 8살 남자애는 소시지를 입에 가득 물고 웃는 얼굴로 엄마를 봤다. 아줌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Od lat nie jedliśmy mięsa…” (몇 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어…)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애들이 잠든 시간. 내 방문이 열리며 아줌마가 들어왔다. 그녀는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피부는 여전히 탄력 있었다. 그녀는 고맙다고 하며 천천히 옷을 벗었다. 나는 물었다. “괜찮으세요?”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좆을 쓰다듬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사함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고통과 한 순간의 위안이 섞인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잠옷을 천천히 벗고 내 위로 올라왔다.
“Proszę… zrób to dla mnie…” (부탁이야… 나를 위해 해줘…)
그녀의 보지가 내 좆 위에 내려앉았다.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이 내 좆을 감쌌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다. “Ох… jaki duży… wypełniasz mnie…” (아… 너무 커… 나를 가득 채워…)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에 떨어졌다. 그녀는 허리를 더 빠르게 흔들며 “Proszę… mocniej… chcę zapomnieć…” (제발… 더 세게… 잊고 싶어…)라고 속삭였다. 그 말 속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졌다. 소련 붕괴 후 세상이 뒤집힌 폴란드, 하루 노동자 임금 120PLN 시대, 남편은 광산으로 떠나고 애들은 고기를 몇 년째 못 먹은 삶. 그녀의 신음은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아래에서 허리를 치켜들어 박아 올렸다. 그녀의 보지가 좆을 꽉 조여오며 애액이 내 배를 적셨다. 그녀의 신음이 점점 커졌다. “Tak… tak… właśnie tak…!” (그래… 그래… 바로 그렇게…!) 그녀의 몸이 떨리며 첫 번째 오르가즘에 도달했다. 보지가 경련하듯 조여오며 애액이 분수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침이 흘러내렸다. “Ох… Boże… dziękuję…” (아… 신이여… 고마워…)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에 떨어졌다. 그녀는 울면서도 허리를 멈추지 않았다. “Jeszcze… proszę… jeszcze raz…” (한 번 더… 제발… 한 번 더…)
두 번째 오르가즘.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애액이 시트를 적시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을 세게 잡으며 “Więcej… daj mi więcej…” (더… 더 줘…)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보지가 좆을 꽉 물었다. 그녀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며 애액이 분수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침이 흘러내렸다. “Nie mogę… umieram z szczęścia…” (못 참아…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그녀의 허리가 점점 느려지며 몸이 힘없이 늘어졌다. 그녀는 실신하듯 내 위에 쓰러졌다. “Dziękuję…… dziękuję…” (고마워……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나는 그녀를 안은 채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빈곤과 외로움, 그리고 한 순간의 따뜻함에 대한 감사였다.
나는 그날 밤 그녀를 안고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집을을 떠났다.
| 이 썰의 시리즈 (총 35건) | ||
|---|---|---|
| 번호 | 날짜 | 제목 |
| 1 | 2026.02.19 | 나의 인생살이 39 (2) |
| 2 | 2026.02.19 | 현재글 나의 인생살이 38 (3) |
| 3 | 2026.02.17 | 나의 인생살이 37 (8) |
| 4 | 2026.02.14 | 나의 인생살이 36 (5) |
| 5 | 2026.02.14 | 나의 인생살이 35 (6) |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Comments

 MIU CASINO
1시간전
MIU CASINO
1시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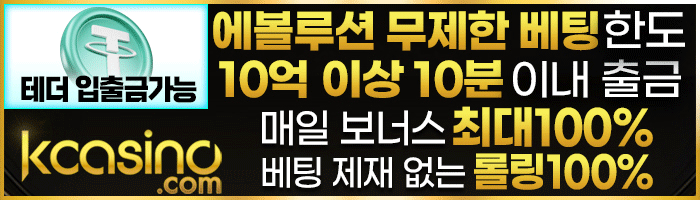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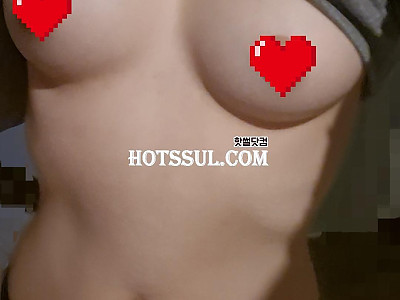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괜찮아좋아질거야
괜찮아좋아질거야 Blazing
Blaz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