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아래 헬창 누나와 헬창 삼촌 3
 정철2
49
4043
25
2025.08.18 01:09
정철2
49
4043
25
2025.08.18 01:09
방 안에 들어서자 미묘하게 달콤하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감돌았다.
땀냄새와는 다른 비릿하고 달콤한 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비췄다.
삼촌은 천장을 보고 반듯이 누워 있었고 누나는 삼촌의 몸 위에 배를 대고 엎드린 채 고개만 옆으로 돌려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는데 한쪽 팔은 삼촌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팔은 삼촌의 가슴팍에 편안히 놓여 있었다.
둘 다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지 않아 몸이 적나라하게 보였는데 예상대로 둘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였다.
누나의 넓은 골반은 삼촌의 허벅지 위로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었고 누나의 거유는 삼촌의 가슴팍에 눌려 납작하게 퍼져 있었다.
발목에 겨우 걸쳐진 검은색 레이스 팬티는 밤새 얼마나 격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짐작케 했다.
누나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짙은 구릿빛 피부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후끈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을 가장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건 얽혀 있는 두 사람의 하체였다.
누나의 엉덩이는 물론 삼촌의 굵고 단단한 육봉이 누나의 축축한 보지에 깊숙이 박힌 채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다 보였다.
삼촌의 손은 누나의 엉덩이 한쪽을 움켜쥐고 있었고 누나의 입술 사이에서는 나지막한 신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깊은 잠에 빠져든 누나는 꿈속에서조차 만족스러운 듯 삼촌의 허리를 더욱 끌어안은 채 몸을 뒤척였다.
그 움직임에 따라 삼촌의 자지가 누나의 보지 속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고 누나의 입술에서 나른한 한숨이 터져 나왔다.
정액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두 사람이 운동하던 후에 나던 땀 냄새와는 다른 농염한 페로몬 같은 것이 방 안에 짙게 배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누나의 벌어진 허벅지 사이에 삼촌의 단단한 자지가 박혀 있는 그 결합부에서 희고 진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누나의 깊은 곳을 채웠던 뜨거운 정액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끈적한 실처럼 이어지며 누나의 엉덩이 골과 삼촌의 허벅지 안쪽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설마......안에 싼 거야?'
숙면 중에 조임을 이기지 못하고 삼촌이 안에 싼 거라 생각한 나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의 몸은 잠결에도 서로의 쾌락에 완벽하게 반응하며 밤새도록 이어졌던 교감의 연장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처음 문 밖에서 누나와 삼촌이 내는 소리를 듣기만 하고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온갖 상상력을 자극하여 내 자지는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발기는 풀리고 그 대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쿵쾅 뛰었다.
* * *
그 뒤로 방에 돌아온 나는 사정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잘 서지도 않는 자지를 쥐어 자위를 반복했다.
한 번 사정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 한 번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자위가 한창일 때 누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랑 삼촌은 항상 이른 아침마다 조깅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나는 둘이 나가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한다. 부엌에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다 누나와 삼촌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와 보니 아침이 차려져 있었고 또 돈이 놓여 있었다.
차려진 아침 옆에는 편지가 있었는데 아침은 차려진 것을 데워 먹고 점심은 이 돈으로 해결하라고 쓰여 있었다.
아무래도 금방은 안 돌아오려는 모양이었다.
어차피 오늘은 등교도 안 하는 날이라 같이 어디 놀러 가기라도 한 건가 싶었는데 두 사람은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생각하던 차에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다.
삼촌이랑 자기는 지금 찜질방에 있으니 그리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자는 것이었다.
뭔가 찜찜하기는 했지만 일단 나는 누가 알려 준 찜질방으로 가서 누나와 삼촌을 만났다. 누나는 말투나 나를 대하는 태도가 평소와 똑같았다.
"배 많이 고프지? 우리 빨리 식당 가서 뭐 좀 먹자."
그런데 정작 나는 어젯밤의 그 광경을 직접 봐서인지 누나와 똑바로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다.
찜질복을 입고 있어서인지 누나의 거유가 더 부각되어 보였다.
우리는 찜질방 식당으로 가서 저녁 끼니를 해결한 다음 찜질방 안을 돌아보기로 했다.
누나와 삼촌은 이미 오늘 낮 동안 몇 군데를 돌아봤다고 한다.
뜨거운 데 있다가 차가운 데에 들어가면 혈액순환에 찍빵이라며 삼촌이 아이스방으로 가자고 하는데 갑자기 누나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도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며 나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곧 복도 코너 너머로 사라졌다.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작은 볼일만 마치고 오는 것 치고는 너무 시간이 걸리자 화장실 쪽으로 가 보기로 했다.
화장실은 한 곳이 아니었는데 두 사람이 처음 사라졌던 모퉁이 쪽에 있는 화장실은 사람들 발길이 적은 비교적 한산한 곳이었다.
그런데 내가 도착했을 무렵에는 화장실 안에서 억지로 눌러 참는 듯한 누나의 희미한 신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심지어 남자 화장실 안에서 말이다.
그것은 고통의 소리라기보다는 무언가 뜨거운 것을 참아내는 듯한 혹은 간지러움을 견디는 듯한 소리에 더 가까웠다.
곧이어 삼촌의 낮고 굵은 목소리까지 같은 칸막이 안에서 함께 들려왔다.
속삭이는 듯한 소리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누나를 다독이거나 재촉하는 듯한 뉘앙스 같았다.
"하으읏......삼촌, 잠깐만......아흣!"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누나의 교성이 터져 나왔다.
너무 조그마한 삼촌의 목소리와는 달리 누나의 목소리는 본인도 주체가 안 되는지 약간 좀 크게 들려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누나의 목소리는 명백히 쾌감에 젖어 있었다.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젖은 살이 마찰하는 듯한 질척한 소리가 희미하면서도 고요하게 울렸다.
찜질방의 후끈한 열기와는 다른 더 원초적이고 질척한 열기가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피어오르는 듯 했다.
누나의 거친 숨소리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누나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것 같았지만 터져 나오는 신음을 완벽하게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옆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옆 칸막이 안에 숨이 막히는 열기가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지는 듯 했다.
나는 소음이 나지 않게 커버를 올린 다음 변기를 발판으로 삼아 내 키를 높였다. 눈이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나는 위를 통해 옆 칸막이 안을 살짝 훔쳐봤다.
| 이 썰의 시리즈 (총 21건) | ||
|---|---|---|
| 번호 | 날짜 | 제목 |
| 1 | 2026.02.07 | 한지붕 아래 헬창 누나와 헬창 삼촌 21 (14) |
| 2 | 2026.01.24 | 한지붕 아래 헬창 누나와 헬창 삼촌 20 (17) |
| 3 | 2026.01.09 | 한지붕 아래 헬창 누나와 헬창 삼촌 19 (14) |
| 4 | 2025.12.23 | 한지붕 아래 헬창 누나와 헬창 삼촌 18 (12) |
| 5 | 2025.12.06 | 한지붕 아래 헬창 누나와 헬창 삼촌 17 (14) |
| 19 | 2025.08.18 | 현재글 한지붕 아래 헬창 누나와 헬창 삼촌 3 (49) |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Comments
49 Comments


 AVEN CASINO
1시간전
AVEN CASINO
1시간전
AVEN CASINO 신규첫충 40%, 페이백 10%, 콤프 4%,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VIP 전용 사이트! 핫썰 포인트 30,000점 증정

 MIU CASINO
1시간전
MIU CASINO
1시간전
MIU CASINO 신규첫충 40%, 페이백 10%, 콤프 4%,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VIP 전용 사이트! 핫썰 포인트 30,000점 증정
재미있어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177 Lucky Point!
글읽기 -100 | 글쓰기 +2000 | 댓글쓰기 +100
총 게시물 : 50,11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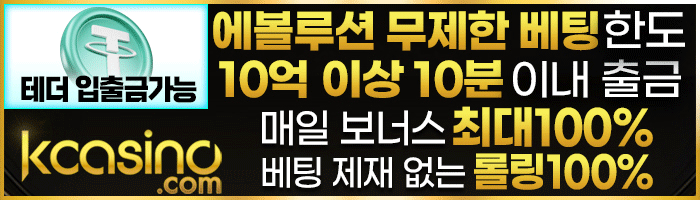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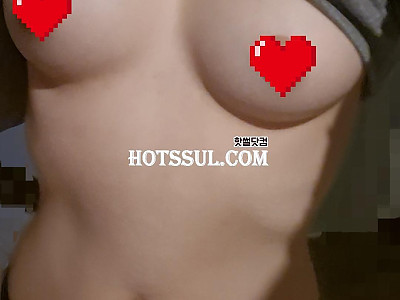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비나무
비나무 박은언덕
박은언덕 KEKEKE
KEKEKE 닉도리
닉도리
 돼지aaa
돼지aaa 테웨이
테웨이 비틀자
비틀자 아젤
아젤 장년
장년 e2389928
e2389928 꾼이야꾼
꾼이야꾼 니나노5
니나노5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고미뽀야
고미뽀야 아마르
아마르 꿍따리19
꿍따리19 개쌈마이
개쌈마이 김하설
김하설 dodosae
dodosae 규정
규정
 케이KKK
케이KKK 머마마머
머마마머 머슬머슬맨
머슬머슬맨 미르1004
미르1004 몽키3
몽키3 도도돗돗
도도돗돗 쏭두목
쏭두목 Blazing
Blazing 릴카
릴카 난다난다나다
난다난다나다 기모지니기
기모지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