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지지 않는 거래 8
 조까는
38
1625
22
01.11 16:57
조까는
38
1625
22
01.11 16:57
원주 집에 도착한 순간, 세상이 조용히 숨을 죽였다.
청산이와 봉구가 현관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황소처럼 거대한 삽살개 두 마리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내 다리를 들이받았다. “야, 야… 진정해, 진정해…” 나는 웃으며 그들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었다. 청산이는 내 손등을 혀로 훑으며 기쁨을 표현했고, 봉구는 형수를 보더니 더 크게 꼬리를 흔들었다. 형수는 처음 보는 거대한 개들에게 살짝 놀라면서도,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아… 예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봉구가 그 손을 혀로 핥자, 형수의 입가에 아주 작은, 그러나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희미하고, 아름다웠다. 그 미소 한 번에, 내 가슴속에 묻혀 있던 오래된 상처가 살짝 벌어졌다. 형수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미소가 너무 드물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 미소는 바람에 스치는 파도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만 같아서, 더 아프게 다가왔다.
집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우리를 맞았다. 내가 비트코인으로 번 돈으로 직접 설계하고, 소장으로 뛰면서 지은 집. 누가 A/S도 안 해주는, 내 손때가 묻은, 내 피와 땀이 스민 집. 벽난로 옆에 놓인 커다란 소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녀를 맞이한 것처럼 조용히 빛났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원주의 밤하늘. 별들이 흩어진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만든 무대였다. 형수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은 채로 거실을 빙 둘러보았다. “와… 정말… 대단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감탄이, 내 가슴을 살짝 간질였다. 그 감탄 속에, 아주 작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내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형수를 보며 말했다. “씻고 와요. 빨리.”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옷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다.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 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피부, 브래지어 끈을 내릴 때 살짝 떨리는 어깨선.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형수는 옷을 다 벗고, 물기 어린 몸에 수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샤워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아니, 물소리인지, 소변을 보는 소리인지, 그 작은 소리조차 내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밤바다의 파도처럼 내 가슴을 끊임없이 때렸다. 그리고 그 파도는 더 뜨겁게, 더 아프게 나를 적셨다.
잠시 후, 형수가 나왔다. 물방울이 그녀의 가슴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물방울은 달빛을 받아 은빛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수건이라도 걸치고 나와요. 누가 꼴려 죽일 일 있나?”
형수는 살짝 놀라서, 그러나 곧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삼촌이… 다 벗고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호텔에서…”
나는 피식 웃었다. “그땐 형수 기합 잡을려고 한 거죠.”
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가슴이 다시 아렸다. 그 웃음은 봄날의 첫 꽃잎처럼 부드럽고, 연약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물었다. “아, 맞다. 형수… 관동대학 나오셨죠? 고향이 강원도예요?”
형수가 대답했다. “네… 동해예요.”
“그렇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형하고는 통화 했어요?”
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오늘 낮에…”
“뭐래요? 뭐 하고 있데요?”
형수는 고개를 숙였다. “…돈 다 갚고 마음이 편해져서… 누워 있데요.”
나는 짜증이 치밀어 올라,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형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게요.”
9시가 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러 들어갈까요?”
형수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나는 형수에게 말했다. “내일 화장품이랑 형수 필요한 거 사러 가요.”
형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리고 형수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 바지를 천천히 벗기고, 팬티를 내렸다. 이미 단단해진 내 성기를 꺼내자, 형수는 망설임 없이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하고 촉촉한 입안이 나를 감쌌다. 나는 형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형수… 보지 제 입에 갖다 대요.”
형수는 순순히 몸을 돌렸다. 엎드린 자세로 다리를 벌리고, 그녀의 보지가 내 눈앞에 드러났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곳을 혀로 핥았다. 후루루룩… 쩝쩝… 형수는 몸을 떨며 작은 비음을 흘렸다. “음… 으…”
나는 더 깊이, 더 강하게 빨아들였다. 형수의 허벅지가 떨리고,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나는 그녀의 엉덩이를 잡고, 더 세게 혀를 놀렸다. 형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신음을 삼켰다. “아… 삼촌…”
나는 그녀를 뒤에서 끌어당겼다. 그리고 힘차게 그녀의 보지를 뚫었다. 형수는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켰다. “아아…!”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움직였다. 형수의 몸이 내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다. 그녀의 신음이 점점 커졌다. “삼촌… 아… 너무… 깊어…”
나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수… 너는 이제 내 거야.”
형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네… 삼촌…”
나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향해 끝없이, 끝없이 움직였다.
형수는 울면서도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톱이 내 등을 파고들었다. 그 고통마저 달콤했다.
나는 알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가 나를 원하게 될 때까지. 내가 그녀를 놓지 않을 때까지.
영동고속도로의 끝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수의 입술이 다시 내 성기를 감쌌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그녀의 눈물이 내 다리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울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수…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리고 그 끝은… 아마도 형수가 내 품에서 울며 “사랑해”라고 말할 때가 될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잔인하고, 하지만 어딘가 슬펐다. 복수는 이제 사랑이 되었다. 아니, 사랑으로 위장된 복수였다. 그리고 나는 그 끝을 보고 싶었다. 형수가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나를 바라보는 순간을.
나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형수는 울면서도 내 등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밤을 함께 불태웠다.
끝나지 않을 거야.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끝은… 아마도 우리 둘만 아는 아주 깊은 곳에 있을 거야.
나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수… 오늘 밤은 더 길게… 더 천천히… 더 깊게…”
형수는 울면서도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밤을 끝없이 이어갔다.
형수의 숨소리가 내 귀에 닿을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형수는 울면서도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다.
형수의 눈물이 내 가슴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형수…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 이 썰의 시리즈 (총 19건) | ||
|---|---|---|
| 번호 | 날짜 | 제목 |
| 1 | 2026.01.20 | 잊혀지지 않는 거래(마지막) (25) |
| 2 | 2026.01.19 | 잊혀지지 않는 거래 (20) |
| 3 | 2026.01.18 | 잊혀지지 않는 거래 20 (20) |
| 4 | 2026.01.18 | 잊혀지지 않는 거래 19 (19) |
| 5 | 2026.01.16 | 잊혀지지 않는 거래 18 (24) |
| 15 | 2026.01.11 | 현재글 잊혀지지 않는 거래 8 (38) |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Comments

 AVEN CASINO
1시간전
AVEN CASINO
1시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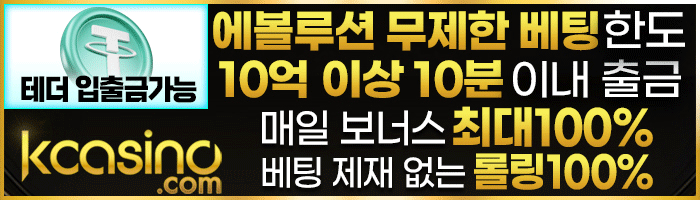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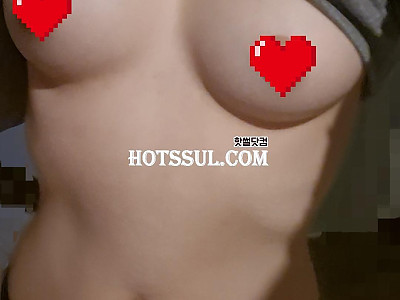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계명04
계명04 Blazing
Blazing 보연이
보연이 청다리
청다리 경타이
경타이 dfgxjdi
dfgxjdi 삼봉산
삼봉산
 육육
육육 땅굴
땅굴 쏭두목
쏭두목 불랴요ㅗ년
불랴요ㅗ년
 니노니
니노니 국화
국화 빡빡이정
빡빡이정 아네타
아네타 다이아몬드12
다이아몬드12 3번
3번 흐린기억
흐린기억 dark888
dark888 삐에로
삐에로 이사람
이사람 헔삵
헔삵 미르1004
미르1004 화이트썬룹
화이트썬룹 하늘여행객
하늘여행객 허걱헐
허걱헐 현서기
현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