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지지 않는 거래 10
 조까는
29
1650
13
01.12 14:29
조까는
29
1650
13
01.12 14:29
며칠 동안 거의 같은 일과가 반복되었다. 아침이면 형수는 일찍 일어나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나를 깨웠고, 나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내 말 한마디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내 눈빛만으로도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 손가락 하나가 허공을 가리키면 그녀의 다리가 저절로 벌어졌다. 잔인함이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나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의 신음은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 스며든 체념, 그리고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반항의 불씨. 나는 그 불씨를 보며 더 잔인해졌다. 그녀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큰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형수를 불렀다. “형수… 큰아버지 제사에 가실 거예요?”
형수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가긴 해야 할 텐데… 00씨랑 상의해봐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마치 내 허락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한테 전화 해봐요.”
형수가 핸드폰을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00씨… 잘 지내요? 저는… 잘 있어요. 근데 며칠 후 아버님 제사… 어떻게 해야 할지… 가봐야겠지요?”
전화 너머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래… 가야지…”
형수가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오면 좋겠다는데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가요… 같이.”
큰아버지 제사 날, 우리는 원주 큰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차 안은 무거웠다. 형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큰아버지 댁은 여전했다. 오래된 한옥, 마당에 세워진 제단, 그리고 친척들의 목소리. 둘째 사촌 형이 제사를 모시고 있었고, 셋째 형도 와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둘째 사촌 형이 반갑게 말했다. “00이 왔네… 고마운 내 동생…”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저… 병신같은 놈…’
형수는 가족들에게 인사하며 주방으로 갔다. 주방에서 깔깔대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다. 9시가 조금 넘자, 나는 형수를 2층 내가 자취하던 방으로 불렀다. 오래된 방. 벽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겨울이면 고드름이 얼던 그 방. 나는 문을 잠그고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치맛속에 손을 넣고, 팬티 위로 보지를 세게 문질렀다. 형수가 작게 신음하며 내 목을 감쌌다. “아… 삼촌… 여기서…?”
나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쉿… 조용히.”
내 손가락이 팬티를 젖히고, 그녀의 보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젖어 있었다. 그녀의 안벽이 손가락을 세게 조였다. 그녀는 입을 막고 신음을 삼켰다.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에 떨어졌다. 나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형수… 여기서도 젖네… 나 때문에?”
형수가 작게 흐느꼈다. “죄송해요… 입으로…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삼촌한테… 힘들게 받는 걸… 흑…”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10분쯤 그렇게 그녀를 만지다, 나는 그녀를 내려 보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방에 혼자 남아 한참을 회상에 잠겼다.
고교 시절… 친척들에게 부러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으며 항상 아웃사이더 생활을 했던 나. 부모님의 기대와 친형님들의 응원 속에서 잘 커왔다.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은… 모두 자기밖에 몰랐다. 내가 살던 2층은 블록으로 대충 쌓은 집이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겨울에는 고드름이 얼었다. 아침에는 햇살이 벽 사이를 통과하고… 그런 집이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여기서 살라고 하셨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큰어머니가 강요했던 것이었다. 당시 한 달 150,000원이면 더 좋은 하숙집에서 살 수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강요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서 살았다.
그래도 괜찮다. 성공했으니… 근데 큰아버지는 정말 나한테 잘해줬다. 지금도 기억난다. 저녁때 밥 먹으러 내려가면 하얀색에 하늘색 하마가 그려진 파자마 바지를 입으시고 안방에 누워서 “00이 왔냐? 밥 먹어라…” 그러시면서 유일하게 날 챙겨 주셨다. 고2 때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 길로 세상을 뜨셨다. 내가 서울대를 합격했을 때에도 큰어머니는 “난 00이가 될 줄 알았어. 이 집이 운이 좋은 집이야.” 그러면서 우쭐대셨다.
어쨌든 이 집 사람들은 정말 밉고 보기 싫었지만, 큰아버지 제사이기에 온 것이다. 유일하게 이 집에서 날 사람으로 보아준 분이셨기에.
제사가 끝나고 작은 사촌 형이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물었다. “뭐가요?”
작은 사촌 형이 형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 데리고 갈 거냐?”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네. 왜요?”
작은 사촌 형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나는 형수를 데리고 돌아왔다. 오는 도중 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삼촌… 아버님을 좋아하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인간미가 있는 분이셨어요. 조카라고 챙겨 주시고…”
형수가 작게 말했다. “네… 그러셨군요…”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옷을 벗고 샤워실로 들어갔다. 형수는 급하게 옷을 벗고 샤워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죄송해요…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형수는 내 몸을 비누로 씻겼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을, 복부를, 허벅지를. 내 좆을 씻기려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방으로 돌아오자, 형수는 말없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 가운을 풀었다. 내 좆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천천히 빨기 시작했다. 혀가 끝부분을 핥고, 입술로 감쌌다. 5분쯤 지났을까.
“힘들면 됐어… 그만해!”
형수가 내 좆을 빼고 헛구역질을 했다. 그녀의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안았다. 그녀의 몸이 내 품에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서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안겨서 떨렸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고요해졌다.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적셨다. 뜨겁고 짭짤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굴복했다. 내 눈빛 하나에, 내 손가락 하나에. 그녀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신음, 그녀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건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이제 우리 모두를 삼키기 시작했다. 완전히. 영원히. 형수의 눈물이 그 불꽃을 더 크게 지폈다.
| 이 썰의 시리즈 (총 24건) | ||
|---|---|---|
| 번호 | 날짜 | 제목 |
| 1 | 2026.01.20 | 잊혀지지 않는 거래(마지막) (25) |
| 2 | 2026.01.19 | 잊혀지지 않는 거래 (20) |
| 3 | 2026.01.18 | 잊혀지지 않는 거래 20 (20) |
| 4 | 2026.01.18 | 잊혀지지 않는 거래 19 (19) |
| 5 | 2026.01.16 | 잊혀지지 않는 거래 18 (24) |
| 13 | 2026.01.12 | 현재글 잊혀지지 않는 거래 10 (29) |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Com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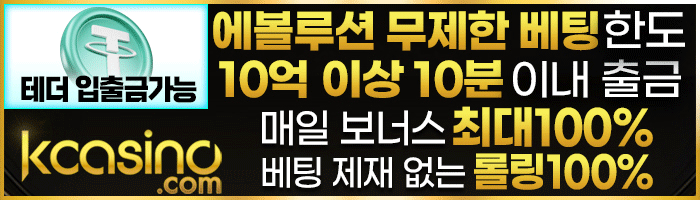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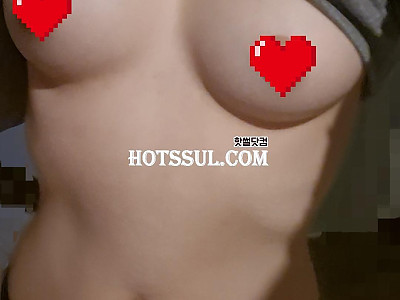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SIAN
SIAN 보연이
보연이 아네타
아네타 Blazing
Blazing 빡빡이정
빡빡이정 다이아몬드12
다이아몬드12
 청다리
청다리 국화
국화 경타이
경타이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삼봉산
삼봉산 쏭두목
쏭두목 불랴요ㅗ년
불랴요ㅗ년 zizizip1
zizizip1 흐린기억
흐린기억 dark888
dark888 익명으로
익명으로 헔삵
헔삵 화이트썬룹
화이트썬룹 하늘여행객
하늘여행객 허걱헐
허걱헐 오씨바놈
오씨바놈 아하하아이게뭐야
아하하아이게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