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인생5
 조까는
10
818
13
2025.12.16 16:45
조까는
10
818
13
2025.12.16 16:45
우리 동아리 '000'는 끝까지 남자 6명으로만 남았다. 보컬 나, 리드 기타 오상기, 리듬 기타 김승유, 베이스 김상훈, 드럼 강기원, 키보드 장승택 – 이 여섯 명이 딱 전부였다. 연습실 들어가면 항상 같은 얼굴들, 같은 앰프 소리, 같은 땀 냄새. 공연 포스터에도 멤버 소개란에 정확히 6명 이름만 올라갔고, MT 가도 6명만 차 타고 가서 불 피우고 노래 부르고 술 마셨다.
은지는 대학 생활에서 나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수능 끝나고 은지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은 친구들 통해 들었지만, 캠퍼스도 달랐고 동아리도 달랐다. 내가 음악 동아리에 빠져 사는 동안, 은지는 자기 학교에서 조용히 자기 길을 갔다. 가끔 SNS로 소식만 멀찍이 보게 됐다 – 머리 짧게 자르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카페에서 책 읽는 사진 같은 것들. 예전의 긴 생머리 교복 입은 은지가 아니라,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연습실에서 마이크 쥐고 서 있었다. 오상기가 기타 솔로 칠 때 옆에서 리듬 맞추고, 강기원이 드럼으로 쾅쾅 때릴 때 몸으로 비트 느끼고, 김상훈 베이스가 낮게 울릴 때 그 위에 멜로디 얹고… 6명만의 사운드가 점점 단단해졌다.
은지와의 추억은 고등학교 때 그 여인숙 방, 방파제 첫 키스, 찹쌀떡 봉투와 함께 그대로 멈춰 있었다. 대학에 와서 새로운 사랑도 하고, 새로운 무대도 섰지만, 은지는 다시 내 일상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끔 공연 끝나고 새벽에 연습실 혼자 남아서 기타 치며 옛날 노래 부를 때, 문득 은지가 생각났다. 통기타 하나 들고 조용히 코드 치며 노래 부르던 그 애가, 지금쯤 어디서 무슨 노래를 듣고 있을까.
하지만 그건 그냥 순간적인 그리움일 뿐이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면 다시 6명만의 락 사운드가 울렸고, 나는 그 안에 서 있었다.
은지는 대학 생활에서 만나지 않았다. 그게 우리 이야기의 끝이었다.
6월 초, 우리 기수의 첫 정기공연이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신입생부터 선배, 교수님들까지 500석 가까이 되는 좌석이 거의 매진됐고, 무대 앞쪽엔 동아리 후배들이 플래카드 들고 서 있었다. 조명이 어두워지자 관객들의 함성이 잠시 잦아들고,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첫 곡은 Metallica의 'For Whom the Bell Tolls'. 세트리스트 맨 앞에 넣은 이유가 있었다. 인트로가 워낙 강렬해서, 공연 시작부터 관객을 잡아채기 딱이었거든. 무대는 완전 어둠에 잠겼다가, 갑자기 붉은 조명이 드럼 세트와 베이스 쪽으로 집중됐다.
강기원(드럼)이 먼저 스틱을 들고… 둥! 둥! 둥! 그 유명한 벨 소리 같은 킥 드럼이 울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메탈 비트가 대강당 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됐다. 이어 김상훈(베이스)이 낮고 웅장한 리프를 쳤다. 둥둥둥둥— 그 베이스라인이 공기를 진동시키며 퍼져 나갔다. 강당 천장까지 울리는 저음이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관객들이 처음엔 숨죽여 듣다가,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며 고개 끄덕이기 시작했다. 오상기와 김승유가 기타를 잡고 들어오고, 장승택의 키보드가 은은하게 깔리면서… 내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Make his fight on the hill in the early day..."
목소리를 깔고 외치자, 강당 전체가 함성으로 터졌다. 그 순간, 몇 달간 새벽까지 연습한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무대 위 6명—나, 오상기, 김승유, 김상훈, 강기원, 장승택—우리의 사운드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 공연은 우리 기수의 첫 번째 제대로 된 무대였다. 그리고 그 인트로가 울린 순간, 우리는 진짜 락밴드가 됐다는 걸 알았다. 지금도 그 저음이 가슴속에 남아 있다.
우리 세트가 끝나자 대강당이 함성과 박수로 한 번 더 터졌다. Metallica로 시작해서 마지막 곡 Nirvana의 'Smells Like Teen Spirit'으로 마무리했는데, 관객들이 일어나서 따라 부르는 바람에 앙코르까지 두 곡 더 했다. 무대 내려오면서 강기원이 드럼 스틱을 공중에 던졌다가 잡고, 오상기가 기타를 어깨에 메고 나한테 주먹을 부딪히며 “미쳤다 오늘” 하고 웃었다. 땀에 흠뻑 젖은 셔츠가 등에 붙어 있고, 목이 좀 쉬었지만, 그 피로감마저 기분 좋았다.
무대 뒤로 내려가서 물 한 병씩 들고 숨 고르는데, 조명이 다시 어두워지더니 다음 순서가 시작됐다. 통기타 어쿠스틱 밴드였다. 3~4명 정도 되는 팀으로, 통기타 두 대와 카혼, 하모니카 하나 들고 나왔다. 조용한 조명 아래 앉아서 잔잔한 포크 송을 불렀다. 우리처럼 헤비한 사운드가 아니라, 맑고 부드러운 코드 진행과 하모니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관객들도 방금 전의 열기에서 서서히 가라앉으며 고개 끄덕이고 손뼉 치고 있었다.
나는 무대 옆 날개에서 물병 들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통기타 소리가 울릴 때마다, 문득 고등학교 때 은지가 혼자 방에서 통기타 치며 노래 부르던 모습이 떠올랐다. 은지는 이런 무대를 좋아했을 텐데. 잔잔하고 따뜻한,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음악.
통기타 밴드가 5곡 정도 하고 내려가자, 다시 조명이 화려하게 바뀌었다. 이번엔 선배들 무대였다. 우리 동아리 3~4학년 위주로 구성된 메인 밴드. 그들은 이미 학교 축제에서도 몇 번 섰던 팀이라 장비도 더 좋고, 연출도 훨씬 화려했다. 연기 피우고 스트로보 조명 터뜨리면서 Guns N' Roses의 'Sweet Child O' Mine'으로 시작했다. 오프닝 솔로가 울리자 강당이 다시 미친 듯이 흔들렸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 그걸 보며 박수 쳤다. 김상훈이 “저 형들 진짜 끝판왕이네” 하면서 웃고, 장승택이 “내년엔 우리도 저렇게 하자” 하고 말했다. 나도 고개 끄덕이며 무대를 봤지만, 마음 한구석엔 통기타 소리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날 공연은 그렇게 이어졌다. 우리의 젊고 거친 에너지, 통기타 밴드의 부드러운 감성, 그리고 선배들의 완성된 무대. 대강당 안은 밤늦게까지 음악으로 가득 찼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진짜 대학생이, 진짜 락밴드가 되어가고 있었다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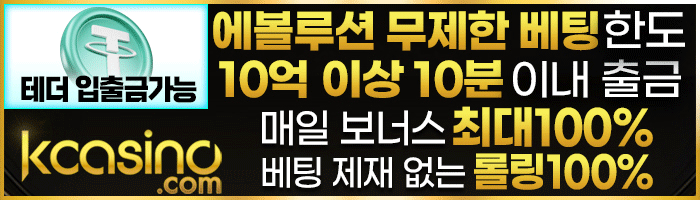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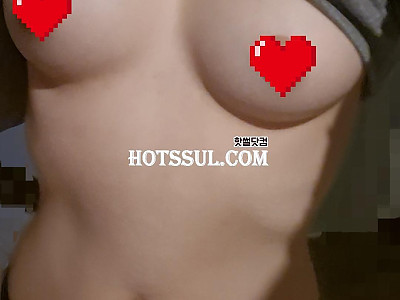






 시드머니
시드머니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면세유
면세유 김성우
김성우 아네타
아네타 몽키3
몽키3 다이아몬드12
다이아몬드12
 핫썰남
핫썰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