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첫경험은 엄마였다 (77)
새해가 되던날, 그날 만큼은 어떤 연통이 있을까
휴대폰만 뚫어지게 처다봤건만,
야속한 폰은 아무 미동도 없었어.
엄마와 나에게로의 회선만 고장난게 아닌가
애먼 의심도.
그러나 결국.
1월도 사흘이나 넘어간 그 밤.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
엄마에게서.
안젤라가 급전이 어지간히 필요했었던지
엄마에게 연락해 못받은 돈 얘길 꺼낸거야.
---------------------------------------------------------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나였는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새벽 1시 10분.
휴대폰 벨소리가 한번 울릴 때 눈이 떠져 몸을 일으켰고,
고작 두 번째 울릴 때 손을 떨면서 화면의 [엄마]를 확인했고
세 번째 벨이 울리기도 전에 숨도 쉬지 않고 급히 열어,
“엄마? 엄마야? 어? 크흠. 엄마 어딘데? 어? 어디야?”
[....................................]
아무말이 없었지만
난 휴대폰을 내 귀 이도에 쑤셔넣어 고막에 가져갈만큼
간절히 귀에 가져다 댔어.
갑자기 벌떡 일어난 탓에, 고함을 지른 탓에
일시적 저혈압으로 머리가 띵 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냈어.
아주 작게 들리는, 고르지 못한 숨소리.
약간의 흐느낌을 먹은 호흡이
엄마가 맞다고 알려줬거든.
내 심장 박동이 너무 크게 들려 소음이 되는게 화가나
심장을 박살내고 싶었어.
나 내가 생각 하는 것 보다도 더 엄마가 보고싶었었나봐.
“어디야... 어? 엄마. 맞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 어?...제바알...
집에오자...엄마 제발...”
[......................................]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어.
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해지는 온기.
집이지만 엄마 없는 차가운 감옥에
드디어 면회온 엄마.
공간을 넘어서 휴대전화 너머 가느다랗고 얇은 가림막으로
나누어졌지만
다 알겠더라고. 떠올라졌고 심지어는 그릴수도 있었어.
엄마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 눈물이 흘러내려 얼굴을 적시고 있는지.
[....큭....흐.......흐으윽흑............]
결국 엄마가 소리죽여 울어버렸을 때.
나도 따라 울었어.
웃기지.
서로 상처를 후벼팠던 헤어졌던 날의 민망함은 사라지고,
한 삼십분이나 그렇게 둘이 울었던 것 같애.
서로 뭐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안보고 싶었는지
보고싶을 때 어떻게 했는지
또 힘든건 없었는지
마치 이국에 사는 연인과의 오랜만의 통화처럼
그런 이야기만 시시콜콜 나눴어.
서로 조심조심. 잠깐 머문 둘만의 평온이 흩어지지않도록.
두 시간의 긴 통화가 모두 끝났을 때 보니 다리가 저려
움직이지 않더라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었었어.
혼났을 때처럼.
새벽4시 근처였지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
엄마는 놀랍게도
멀리, 여수에 있었어.
어찌된 일인지 따질 수도 없었고, 묻지도 못했어.
어떻게 그 먼데까지 가 있었느냐고.
뭐하고 있었느냐고.
그저, 데려와줄 수 있냐해서,
겨울임에도 머리 말리는것도 잊고
급히 동트기에도 먼 새벽에 차 시동을 걸었어.
이렇게 자세히 말해줄건 아니었는데,
더 끄적여보자면,
통화를 마친지 한 시간도 못지나서,
막 고속도로를 타 한창 탄력이 붙을 무렵.
다시 전화가 왔어
[...재영아, 정말 미안한데...]
“어어...말해”
[...엄마, 엄마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오지마 응?]
이게 왠...아...
엄만 뭔가를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정작 중요한건 다 빼먹었어.
뭔가 일이있는데 그거 마치고 며칠내로 갈거라고.
안젤라 아줌마가 밥이랑 반찬 챙겨줄거라고.
그러니까 양방향 휴게소에서 차를 돌리래... 나참.
“아니 무슨소리냐고 일단 가서 얼굴만 좀 볼게 그리고나선 뭘...”
[금방, 금방갈게, 아냐 엄마가 약해져서 딴소리했어,
길도 얼었고, 끊어. 양방향 휴게소에서, 알겠지?
미안해 아들, 응? 일 잘 해결하고 갈게]
“아니....”
[....엄마가...많이 미안해, 응?]
자꾸 무슨 일을 잘 해결한다는건지.
조급해져 쏘아댈까 싶었던 내 입은
엄마의 마지막 끝맺음 말에 닫혔어.
[.......사랑하구.......]
들어보지 못한말에 쩌릿해 머뭇거리는 동안
그렇게 통화가 끊겼어.
ps. 이날 일을 나중에 얘기해줬어.
엄마의 원래 용건은 내가 안젤라 아줌마를 건드린 것,
로봇청소기 잔금. 또 내가 반성은 했는지.
근데, 내 목소리 듣고.
내가 애달프게 엄마를, 자기를 찾자
다 잊어버렸단다.
바보같이.
--------------------------------------
통화가 끊긴지 한참 전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길 내내 다시울려라 다시울려라
휴대폰을 곁눈질 하며
집으로 왔어.
바보같이 녹음을 왜 안해뒀을까.
차도 없었던데 갓길에 세워서 했으면 좋잖아.
그런 위험천만한 생각도 하고.
집에 온 난 어울리지 않게 청소부터 했어.
바닥을 쓸고 닦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엄마 속옷도 (하나만 빼놓고) 빨아 널고.
이제 엄마만 오면 되는데...
엄만 일주일이 더 지나도록 오지 않았어.
안젤라 아줌마, 얘는 또 대체 뭘까.
지난번 성관계 이후로 무슨 중국집 배달도 아니고
두 번 더 현관문 앞에 조용히 음식만 두고 가버렸어.
문자는 쓰기 힘들었는지 뜬금없이 전화로,
전골찌개 다먹었는지, 자기가 만든 거라며 ...어쩌라는거야.
안그래도 심란한 와중이라 듣다가 또 돈 얘기 나올것 같아
다시 네네 존댓말도 해주고, 지금은 바쁘다며 끊었거든.
그 이후로 저래.
돈을 엄마한테 받았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었어.
아니 빚쟁이 같아서 서로 찜찜한데
당분간 얽히기 뭐한데 잘됬다 여겼어.
그나마 위안이 됬던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다시 걸리네. 아...다행이다.
물론 응답은 커녕 받지도 않았었지만.
이따금 언제와? 정도 문자만 보내는것말곤,
할 수 있는게 없더라구.
.
.
.
그렇게 또 몇주가 지나 그해 이른 설이 다가와,
집에 우울하게 있기 뭐해
설마 올까 싶어 대학에 가
학식으로 떡국도 얻어먹고, 근처 사는 녀석 자취집에서 놀다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헛도는 열쇠구멍.
손이 저릿 하더라고.
역시 잠기지 않은 문. 조심스레 열어보니
뜨끈뜨끈한 온기.
현관엔 뉘어있는 여성용 구두. 그러나,
초입부터 코를 찌르며 풍겨오는
강한 알콜 냄새는 낯설었어.
하지만 익숙한 모양의 구두의 주인을 알고 있는 나는
거실의 인기척이 날 겁내 흩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갔어.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
언제부터 틀어놨는지 후덥지근해진 거실 한가운데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채
바닥에 널부러져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있는 여자.
“...엄마”
그러자 헝클어진 헤어가 턱을 드니 좌우로 갈라져
머리카락 사이 드러난
술에 취한 텅빈 눈.
날 가만히 응시하다가,
마른 입술이 달싹이다 나온 말은.
“...성...재씨”
겁먹은 듯 엉덩이를 뒤로 끌며 부른
아버지의 이름.
엄마가 왔어.
근데 부서진 채로.
| 이 썰의 시리즈 (총 78건) | ||
|---|---|---|
| 번호 | 날짜 | 제목 |
| 1 | 2025.10.20 | 현재글 내 첫경험은 엄마였다 (77) (32) |
| 2 | 2025.10.20 | 내 첫경험은 엄마였다 (76) (22) |
| 3 | 2025.10.20 | 내 첫경험은 엄마였다 (75) (27) |
| 4 | 2025.10.20 | 내 첫경험은 엄마였다 (74) (29) |
| 5 | 2025.10.20 | 내 첫경험은 엄마였다 (73) (25) |
블루메딕 후기작성시 10,000포인트 증정
Com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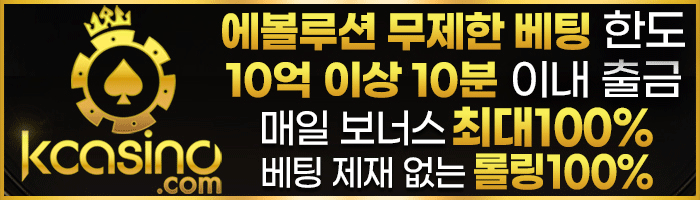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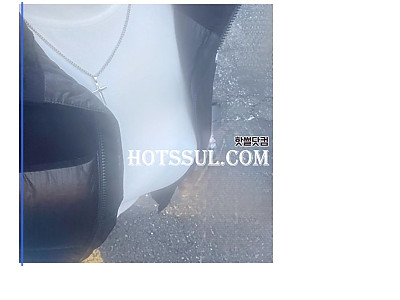







 산타카지노
산타카지노 보연이
보연이 수코양이낼름
수코양이낼름 또또또보
또또또보 Youngi
Youngi
 파룬킁킁
파룬킁킁 나이젤
나이젤 국화
국화 빡빡이정
빡빡이정 비틀자
비틀자 시린호수
시린호수 fidelio01
fidelio01 은별
은별 Lolo1234
Lolo1234 할루하거거
할루하거거 만고
만고
 줌마킬러
줌마킬러 구수규슉서슈규고
구수규슉서슈규고 공개삼
공개삼 호놀로후
호놀로후 anjffhgkfRK
anjffhgkfRK 응큼도사
응큼도사 봄봄14
봄봄14





